결혼·출산 회피, 예능이 비추는 한국의 현실
미디어 통제 택한 중국, 주선율 드라마 확산
탕핑 확산 속 청년 민심, 지원책에도 냉담

“요즘은 결혼 생각이 점점 멀어져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TV를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현실의 부부 갈등이나 양육의 고단함이 여과 없이 비춰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결혼이 과연 자신에게 맞는 선택인지 다시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씨는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주고 제도를 만든다 해도, 내 삶이 좋아질 거란 확신이 안 드니까 결혼이 선뜻 와닿지 않는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결혼은 손해, 출산은 사치… 한국 예능이 말하는 현실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아시아를 덮친 지금, 이웃한 두 강국 한국과 중국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파도에 맞서고 있다.

특히 사회의 가치관을 비추는 ‘미디어’를 대하는 방식에서 두 나라의 생존법은 극명하게 갈린다.
오늘날 한국의 TV 화면은 어쩌면 결혼과 출산이라는 제도가 마주한 위기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혼한 부부의 복잡한 감정을 들여다보는 ‘우리 이혼했어요’나, 파국 직전의 부부 갈등을 적나라하게 해부하는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이 대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OECD 최하위의 냉혹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미디어는 이 현실을 외면하는 대신, 결혼 없이 아이를 원하는 여성(‘오 마이 베이비’)이나 혹독한 산후조리 과정(‘산후조리원’)을 조명하며 시대의 고민을 정면으로 담아낸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미래의 재앙’으로 규정한다. 한국의 사례를 철저한 반면교사로 삼아, 미디어를 국가의 의지를 관철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비혼주의나 딩크족 문화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전통적 남성상과 거리가 먼 ‘냥파오(娘炮)’ 스타일의 인물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예외 없이 철퇴를 맞았다.
그 빈자리는 공산당의 이념과 국정 홍보를 담은 ‘주선율(主旋律)’ 드라마가 빠르게 채우고 있다. 사회 전체의 생각과 가치관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거대한 설계이다.
출산 장려금 쏟아붓는 중국… 청년 민심은 왜 식었나

이러한 이념 통제와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책도 함께 내놓고 있다.
항저우시가 셋째 아이에게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선전시가 다자녀 가구에 주택 우선권을 주는 등 파격적인 정책이 연이어 나온다. 학생들의 숙제와 사교육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솽젠(雙減)’ 정책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극심한 경쟁과 압박 속에 최소한의 생존만을 추구하는 ‘탕핑(躺平)’ 문화가 확산되고, 수십 년간 출산을 억제하다 돌아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게 뿌리내린 탓이다.

결국 두 나라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선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면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 현실을 통제해야 하는가.
한국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답을 더디게 찾아가는 동안, 중국은 국가의 힘으로 정답지를 쓰려 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냉소에서 보이듯, 그 정답이 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인구 위기라는 동일한 숙제 앞에서,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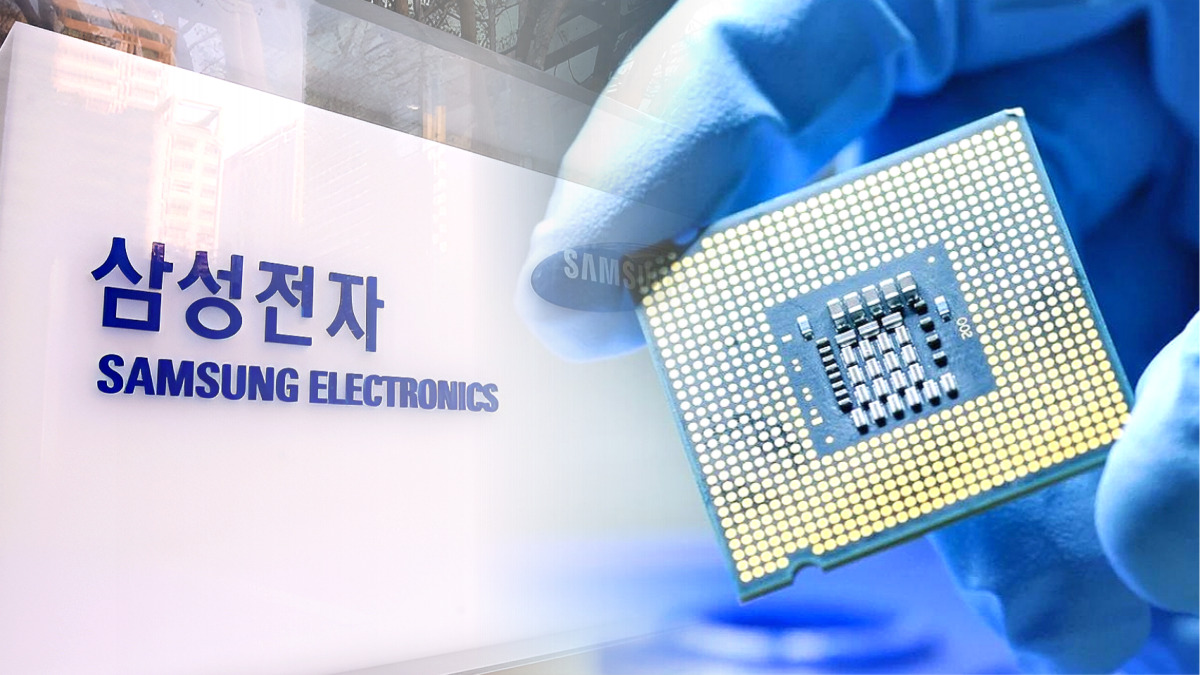










중국이 이건 지혜롭네요
결혼이 꼭 부정적일까요? 혼자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손에 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중독으로 빠져있겠죠.
단점만이 아니라 장단점을 보며 바꾸어야 할 방법을 함께 찾고, 대책을 마련하게 되길
이러한 영역에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구망하는게 지구가 터질만큼 많은 인구때문인데 그만좀낳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