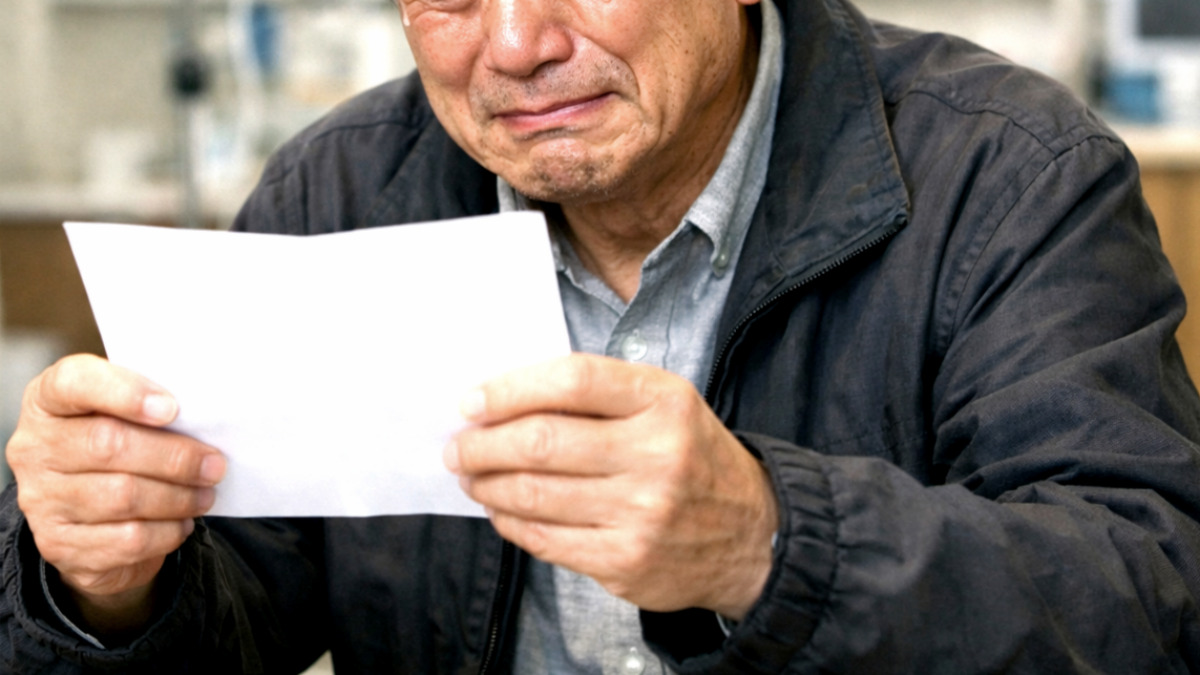해파리, 바다의 주인공 되다…경고등 켜진 연안
이상기후·오염에 천적 사라지며 번식 가속
AI·로봇 방제, 해파리 자원화 연구도 확산

독성 해파리의 습격에 대한민국 연안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해파리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피서객과 어민의 안전은 물론 해양 생태계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여름 바다의 불청객 정도로 여겨졌던 해파리가 이제 연안 생태계의 주인이자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올랐다.
이번 ‘경계’ 경보 발령은 해파리 문제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계절적 현상이 아님을 공식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바다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라며 입을 모은다.
해파리 독성 경보…한여름 바다에 번지는 위험
그 경고의 핵심에는 치명적인 ‘독성’이 자리한다. 최근 급증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 같은 대형 개체는 스치기만 해도 독사나 말벌에 비견될 만큼의 맹독을 주입한다.

쏘일 경우 극심한 통증과 함께 발열, 근육 마비,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최악의 경우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쏘임 사고와 실제 사망 사례는 이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증명한다.
해파리의 역습은 예견된 재앙에 가깝다. 지구 온난화가 데운 바다는 해파리에게 최적의 번식 환경을 제공했다.
육지에서 흘러든 오염물질은 먹잇감인 플랑크톤을 폭발적으로 늘렸고, 무분별한 남획은 쥐치와 바다거북 같은 천적을 바다에서 몰아냈다.
천적이 사라지고 먹이가 넘쳐나는 바다에서 해파리의 번성을 막을 것은 없었다. 인간이 만든 방파제와 인공어초는 이들의 유생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마저 되어주었다.
“해파리와의 전쟁”…정부·현장 총력 대응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어민, 수협과 함께 합동 구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해수욕장에는 차단망과 안전요원을 배치해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해파리에 쏘였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절대 민물이나 알코올이 아닌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단기적인 방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동 예측, 로봇을 이용한 방제 등 첨단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한편, 해파리를 비료나 의약품 원료로 활용하는 ‘자원화’ 연구 역시 역발상으로 주목받는다.
바다의 불청객이 보내는 경고는 명백하다. 눈앞의 해파리 제거를 넘어, 병들어 가는 해양 생태계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