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전기 저장하는 ‘배터리 댐’ 뜬다
중국이 90% 장악…K-배터리 벼랑 끝 승부
정부, 국산 기술에 가점 줘 방어막 구축

전기를 저장하는 거대한 ‘배터리 저수지’가 한국 전력망에 본격 도입된다.
정부가 전국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서, 향후 수십 조 원 규모의 새 시장이 열리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흔들리던 K-배터리 업계엔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전기 저장소 시대 개막…댐처럼 쌓아두는 에너지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이다.

댐이 물을 저장하듯, 전기를 모아뒀다가 부족할 때 공급하며 전력망을 안정화한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ESS는 더 중요해진다. 햇볕 강한 낮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넘치고, 바람 없는 밤에는 풍력이 멈춘다.
ESS가 남는 전기는 충전하고 부족할 때는 방전하며 빈틈을 메운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540메가와트(MW) ESS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는 약 2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2038년까지는 총 23기가와트, 즉 원자력발전소 23기에 맞먹는 규모가 필요하다. 설치 비용만 약 40조 원으로 추산된다.
ESS 시장 90% 장악한 중국…K-배터리의 반격은 가능할까
문제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전 세계 ESS 배터리 시장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CATL을 필두로 한 중국 기업들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에서 독보적이다.
LFP는 기존 삼원계 배터리보다 저렴하고 화재 위험도 낮다. 여기에 최근 에너지 밀도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게 됐다. CATL은 한국 법인까지 세우며 본격 공세에 나섰다.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ESS 사업자 선정에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하고, 배터리부터 핵심 소재까지 국산 여부를 평가 기준에 넣었다.

이는 삼원계 배터리에 강한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다. 삼원계는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니켈·코발트 같은 희귀 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 경제성이 뛰어나다.
ESS는 이제 기술 도입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시험대가 됐다.
지금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 에너지 생태계의 설계도이자, K-배터리가 세계 무대에서 재기할 골든타임이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 지금, 누가 먼저 그 문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거대한 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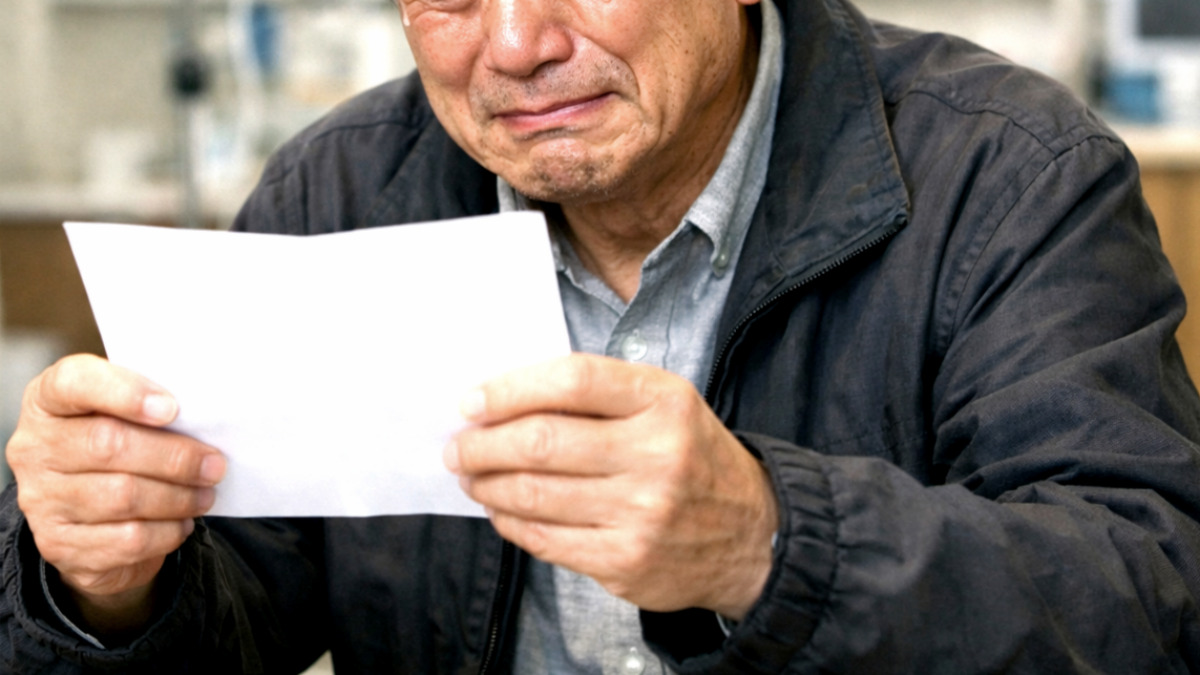










제목보고 위기성 기사인줄 알았는데 뭔 빈정거리는 기사였네 짱깨 똥꼬 많이 빨고 위안화 많이 받으쇼
걱정마라
우리는 이재명 보유국이다
이제부터 k밧데리는 이재명이 살린다
포항 오창 군산=k~밧데리 삼각벨트
오늘 청주 유세에서 정책발표 내용중
밧데리 산업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