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미, 관세 압박 카드
“안보 위협” vs “기술·관광 기회” 팽팽
정부, 8월 최종 결정 앞두고 고심 깊어져

한미 통상 협상의 수면 아래에서, 뜻밖의 쟁점이 부상했다. 중심에 선 건 다름 아닌 고정밀 지도 한 장이다.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여부를 두고, 한국 정부가 안보와 외교, 산업 전략 사이에서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도 안 주면 관세?”…구글 요청에 통상 압박 카드 꺼낸 미국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겠다고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2016년에 이어 올해 2월 세 번째 요청을 낸 것이다.
앞선 두 번은 모두 거절당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 기반시설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였다.

하지만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 트럼프가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나서면서, 통상 협상과 직접 연결됐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구글의 요청이 더는 민간 기술 기업의 사업 제안이 아니라, 통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표면적으로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관계와 수출 산업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안보 구멍” vs “혁신 기회”…정밀지도 두고 찬반 격돌

정밀지도 반출을 둘러싼 찬반 논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대 측은 안보를 가장 큰 이유로 든다. 고정밀 지도와 위성영상이 결합되면 민감한 군사 시설의 위치와 구조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구글 어스를 통해 외국 보안 시설이 여과 없이 드러난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 데이터 주권과 국내 지도 산업 보호를 이유로 든 반대도 나온다.
구글이 지도 시장을 장악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론은 혁신과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다. 자율주행, 드론 배송, 증강현실 같은 차세대 기술들은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한다.

구글과 협력이 가능해지면 이들 산업의 성장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광 활성화 기대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 지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편의성이 높아지고, 관광 수입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일부 연구는 2년간 최대 33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예측하기도 했다.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는 이제 기술이나 산업의 문제를 넘어, 안보와 외교, 미래 성장 전략이 얽힌 복합적 과제가 됐다.
정부는 지금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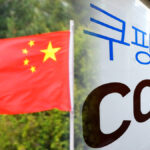




왜안주냐좌파들아! 북한 김돼지한테는 usb국가기밀도 주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