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민생쿠폰, 수수료에 일부 새어 나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 결제 구조에 막혔다
정책 효과, ‘누가 얼마나 받느냐’에 달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름처럼 정부가 12조 원을 풀어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돈이 최종 목적지에 닿기 전 ‘수수료’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국민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선한 정책의 효과가 중간에서 일부 증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 돕겠다더니…결제 구조에 막힌 지원금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오는 9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해 직접적인 내수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노렸다.

하지만 정책의 온기가 소상공인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 딜레마는 이 돈이 ‘카드’에 담겨 쓰인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소비자가 15만 원을 결제하면, 그 돈은 전부 소상공인의 몫이 되지 않는다.
카드사가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으로 국민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카드업계에 쿠폰 사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난색을 보이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미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 중인 우대 수수료율은 수익이 거의 없고, 쿠폰과 자비 결제가 섞인 거래를 처리하려면 전산 시스템 개발 부담도 크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의 줄다리기는 ‘수수료 인하 없는 상호 협력’이라는 미봉책 수준의 업무협약(MOU)으로 귀결됐다. 정책의 선한 의도와 별개로, 이번 조치의 수혜자가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2조 푼 정부, 혜택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흘러갔나
실제 카드사가 거둬들일 수수료 수익은 결코 적지 않다.
쿠폰 사용 방식과 결제 수단 등을 고려하면, 카드 결제 금액은 보수적으로 약 8조 4천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전망은 과거 사례에 기반한다.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약 75%가 카드를 사용한 전례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체 수단과 미사용분을 감안해 전체 12조 원 중 70~85%가 카드로 결제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의 가중 평균인 0.733%를 적용하면, 카드사는 최소 750억 원에서 최대 980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순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지만, 그 규모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소비자는 혜택을 보고 자영업자는 매출이 오르는 선순환의 고리에서,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설계한 온기를 중간에서 새어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돈을 푸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목적지에 가깝게’ 전달하느냐에 달렸다. 12조 원의 향방을 세심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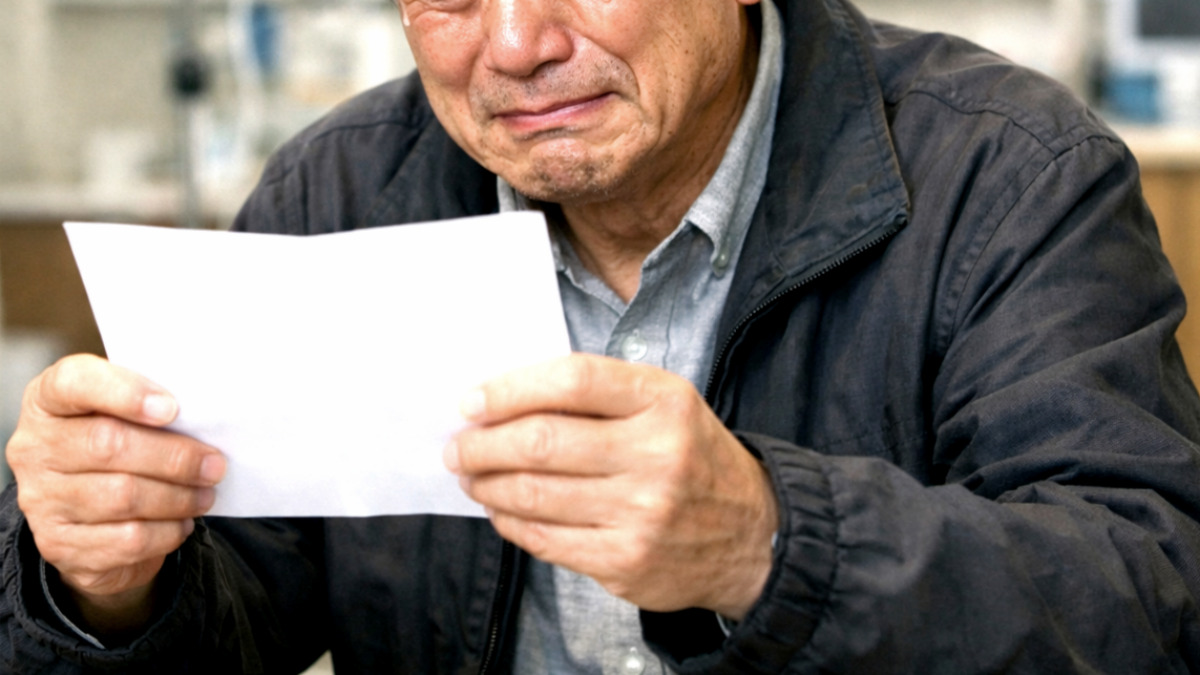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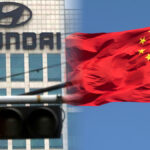





뭔 당연한걸.. 일반카드 사용 수수료랑 뭔 차인지..
지역상품권으로 하지 카드는 뭐하로 합니까
ㅇ
받을사람이 지역상품권으로 받음되지요
그러게내가현금으로달라앙켄나!
별게다 ㅈㄹ이다ㅋㅋㅋ 그럼 흰봉투에 담아주리?ㅋㅋ
그러니 처음부터 계좌로 돈을 넣어줘야지~~
난이런걸 예상했으나 역시 그녛게 돼는군.
선한행동으로 포장된 리베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