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은 폐기…취약계층에 집중
기초수급자 최대 50만 원, 고소득층은 제외
지원금,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

정부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하는 기대감이 커지지만, 이번 지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연말 보너스가 아니다.
당초 약속했던 ‘전 국민 25만 원’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이제 누구의 지갑이 얼마나 두꺼워질지를 결정할 복잡한 셈법이 시작됐다.
‘전 국민 25만’은 접었다…돈, 필요한 곳에 몰아준다
베일을 벗은 민생회복 지원금 추경안의 핵심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이다.

표면적인 액수 너머로, 단순한 현금 살포를 넘어선 정교한 정책 설계가 엿보인다. ‘전 국민 25만 원’을 내걸었던 보편 지원의 약속은, 재정 현실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소득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책의 지향점은 선명하다.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구체적으로 1차 지급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일반 국민은 15만 원을 받게 된다.
이어지는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두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수령액은 최대 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지원금의 명칭은 같지만, 그 내용은 ‘전 국민 25만 원’이라는 초기 구상과는 궤를 달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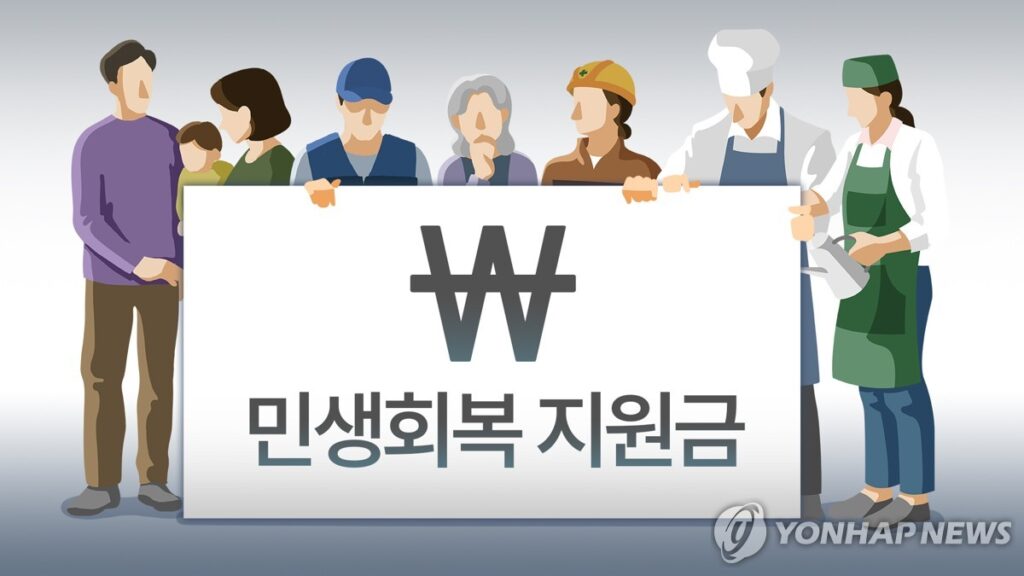
이러한 방향 전환의 배경에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보편 지원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과거 지급된 지원금의 상당수가 소비 대신 저축으로 흘러갔다는 학습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셈이다.
세금은 안 걷히고, 돈은 더 써야 한다…정부의 고육지책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축은 지역화폐다. 총 1조 원 규모의 발행 지원 예산을 통해, 지원금이 대형 유통망이 아닌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흐르도록 물길을 설계했다.

이는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동시에, 할인율 국비 보전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다각적 포석이다.
한편,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 예상보다 저조한 국세 수입으로 올해 역시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을 현실화하는 한편, 국채 발행을 통한 부족분 충당을 고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과거의 시행착오와 재정적 한계를 딛고 내놓은 ‘정교한 맞춤형 처방’에 가깝다. 보편성과 형평성 사이를 오가던 정책의 저울추가 실용과 효율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방향은 정해졌다. 이제 그 정교한 설계가 민생 현장에서 어떤 온기로, 어떤 활력으로 이어질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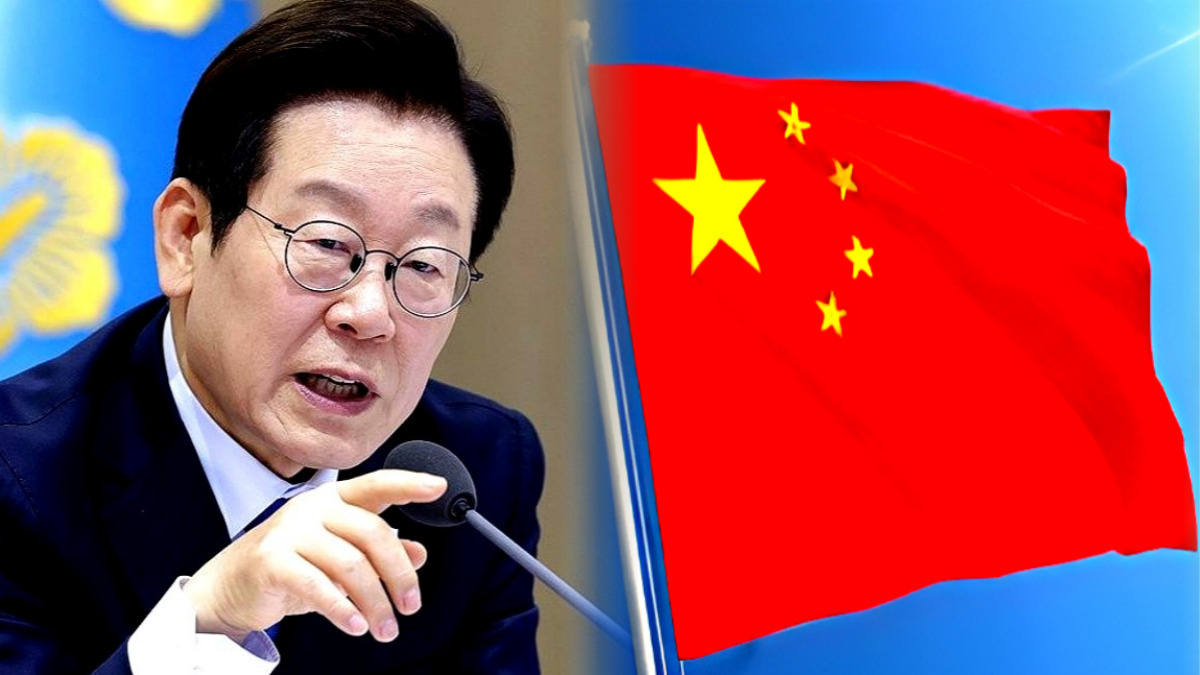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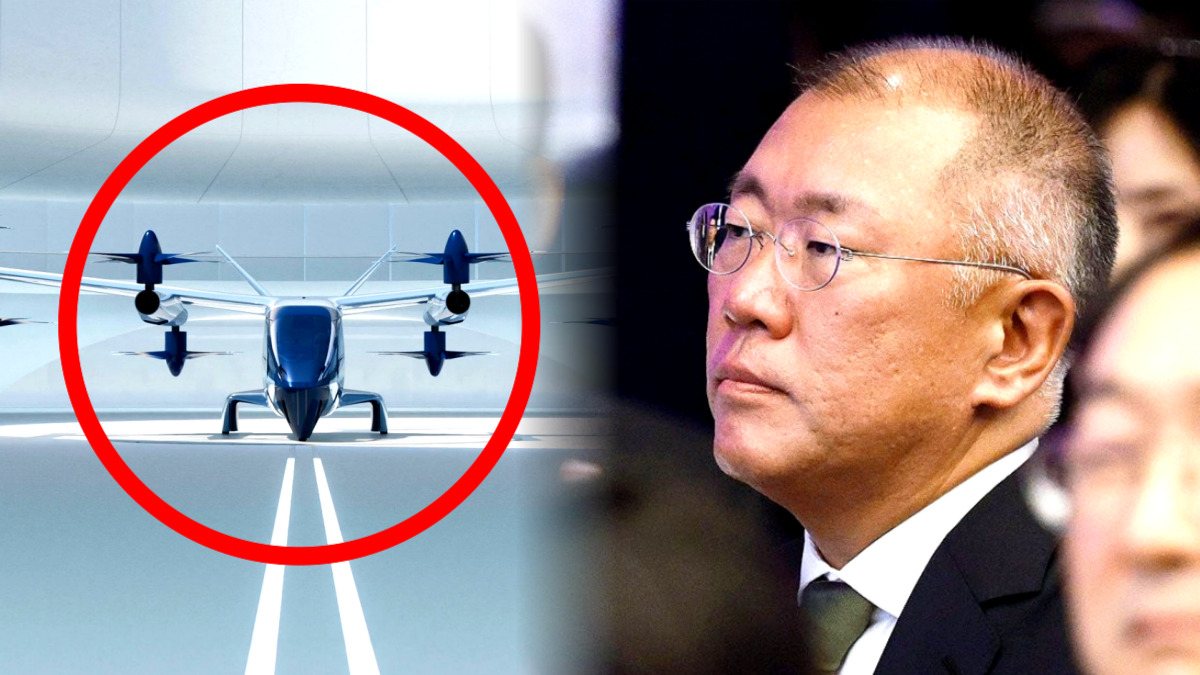














재산은 남 앞으로 돌려놓고 정부지원금 축내는 악덕
평생 세금만 내고, 내고 있고…. 모든 복지혜택은 전부 제외, 열심히 산 댓가가 역차별로 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