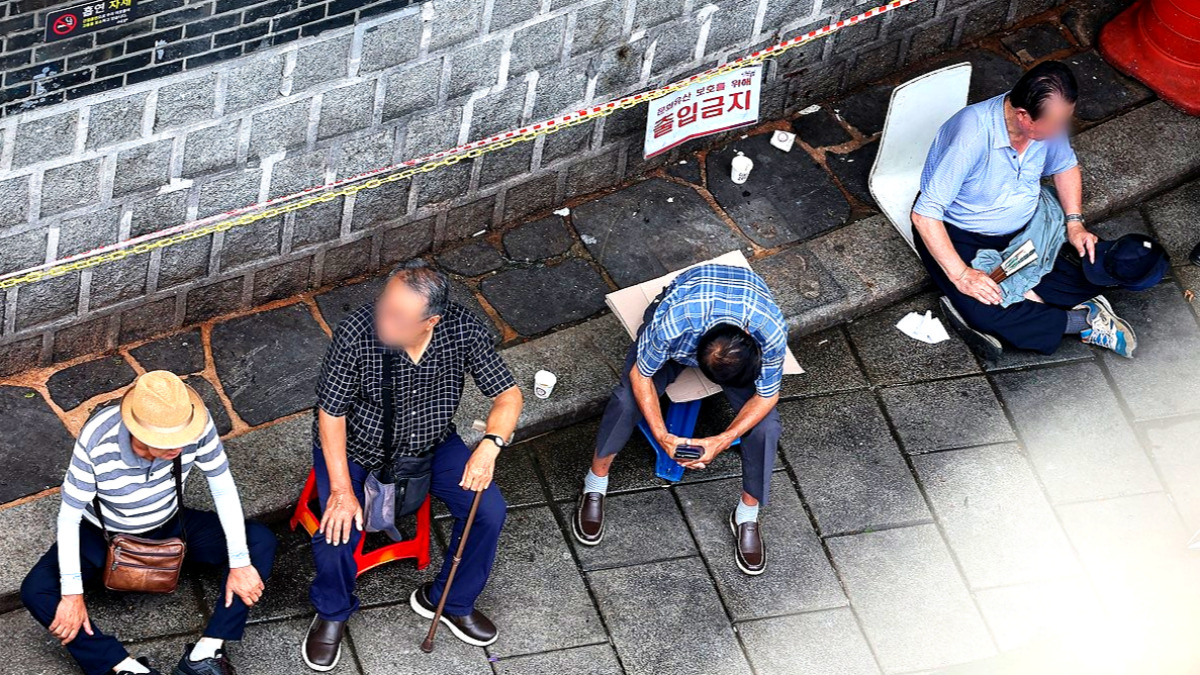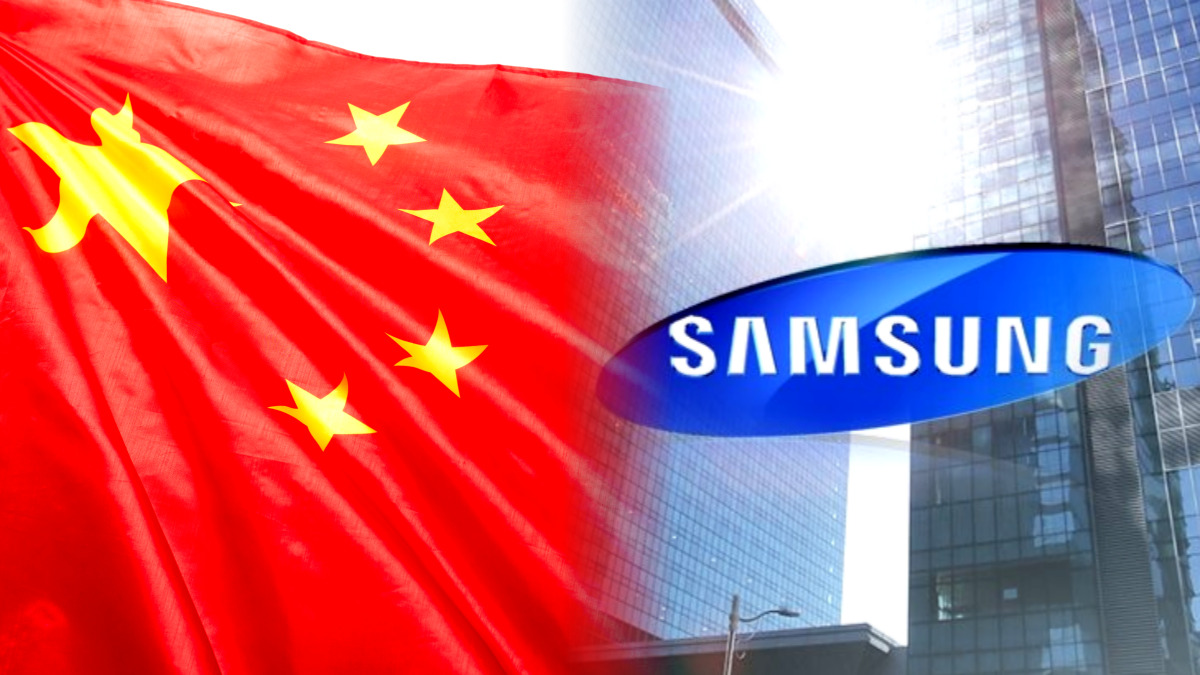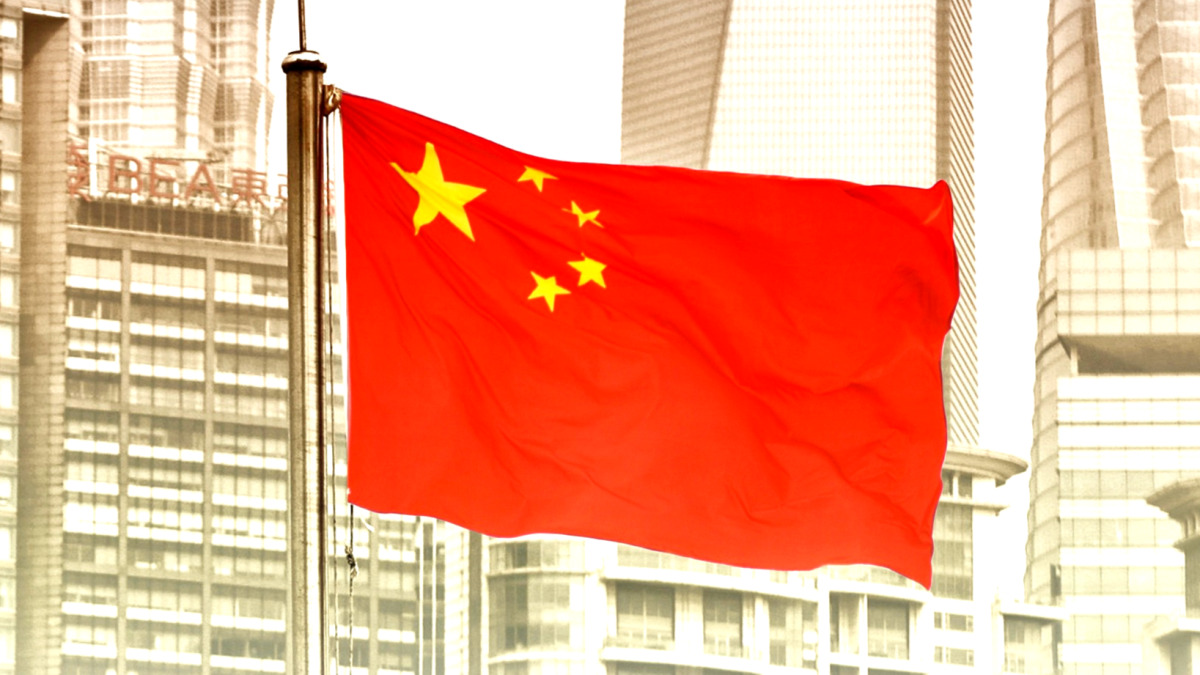환경비용이 순이익 넘어서며
업계 재무구조 압박 심화
정부 지원 없인 생존 한계

“이익보다 환경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시멘트업체 임원의 말이 업계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시멘트업계가 연간 5천억 원대의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까닭은 바로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 때문이다.
투자는 늘고 수익은 줄고
한국시멘트협회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멘트업계의 연평균 설비투자액은 506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85%에 해당하는 4302억 원이 환경규제 대응에 투입됐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업계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42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환경규제 대응 비용이 업계 전체 이익을 상회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수익은 줄어드는데 환경투자는 늘어나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업계의 총 설비투자액은 2조 5306억 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226억 원에서 지속 증가하여 지난해 5788억 원까지 늘었다가, 올해는 건설경기 악화로 5141억 원으로 11.2% 감소할 예정이다.
그런데 환경·안전 분야만큼은 예외다. 지난해 1560억 원에서 올해 1875억 원으로 20.2% 늘어났다. 전체 투자는 줄었지만 환경투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담금 등 강화된 환경규제를 지키려면 환경설비 구축은 필수”라며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투자를 미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비용 신기술과 시장 위축의 이중고
시멘트업계가 환경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으로 환경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처리 등 각종 분야에서 새롭고 엄격한 기준이 연이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최신 환경설비가 대부분 고가라는 점이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신기술은 아직 상업적·기술적 검증이 완전하지 않아 비용이 더욱 높다. 설비 투자액이 한 번에 수천억 원 단위로 상승하는 이유다.
특히 최근 도입된 SCR(선택적 촉매환원) 등 친환경 설비는 소성로별로 막대한 초기 투자와 연간 운영비가 필요하다. 한 번 투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에너지비용,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운영비까지 발생해 재무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와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경 관련 고정비용만 늘어나 손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ESG 경영 확산과 글로벌 투자자의 환경 요구까지 더해져 환경규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됐다.
업계 “정부 지원 절실”

시멘트협회는 “향후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매출 감소와 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환경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환경규제 대응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경규제 비용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도 신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규제가 성장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하고 있지만, 규제 강화 속도와 업계 대응 능력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