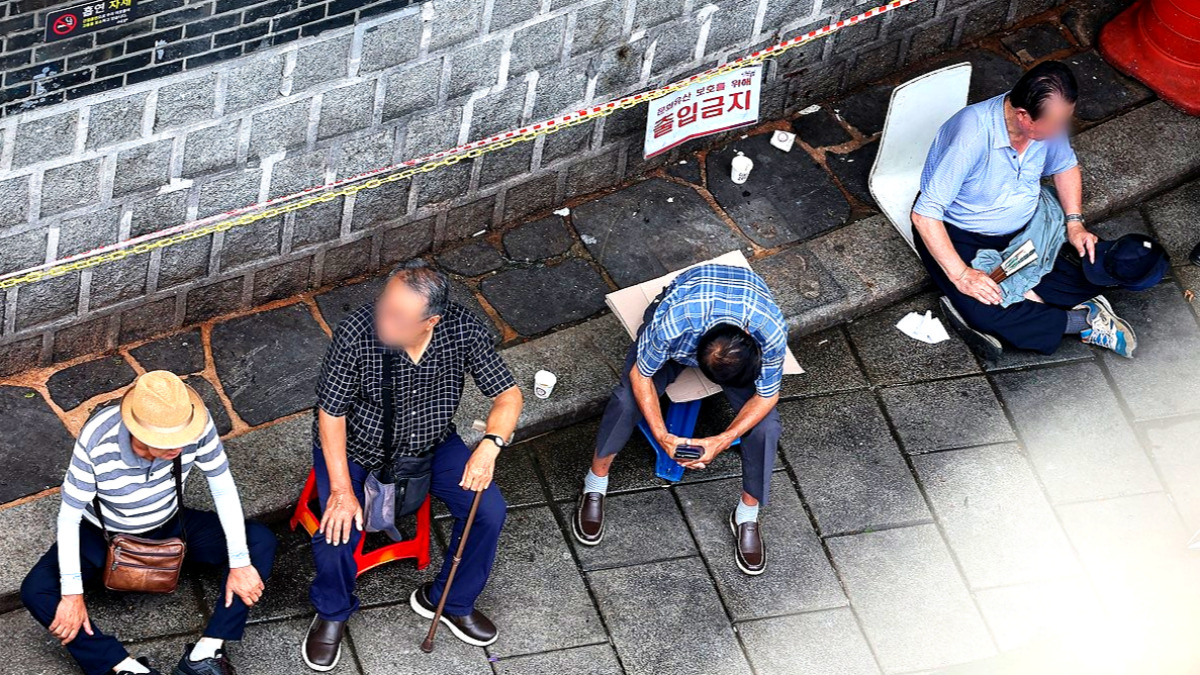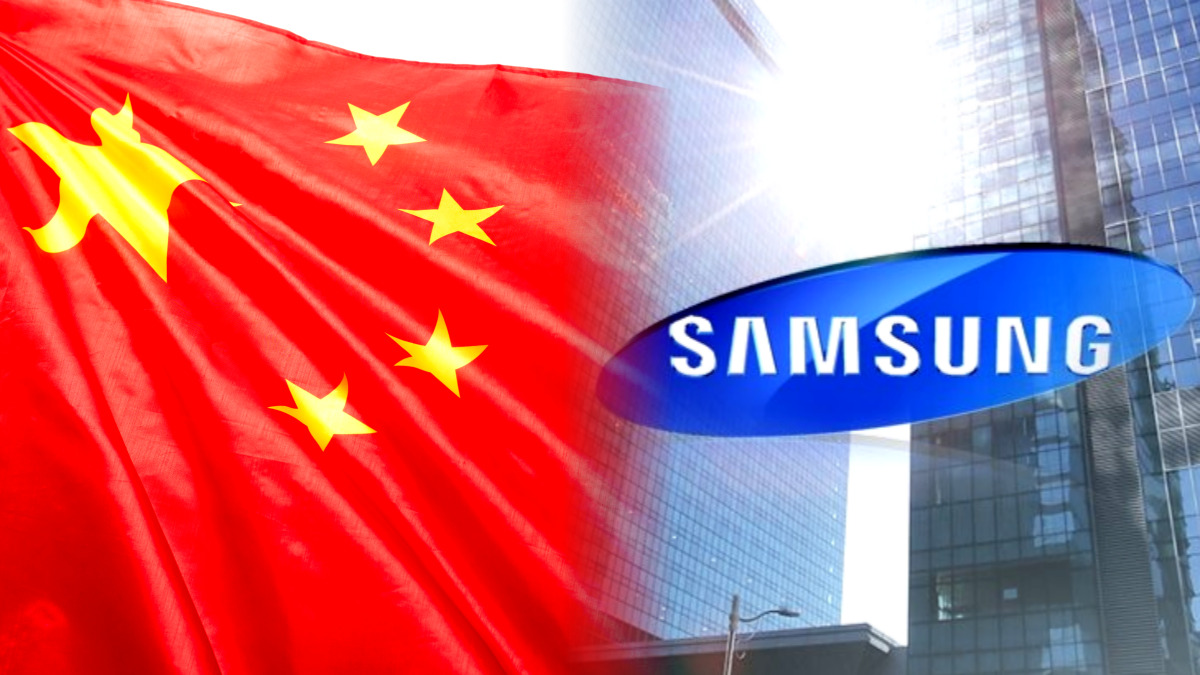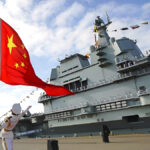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대한석탄공사가 문을 닫으며 석탄 산업이 끝나고 있다
- 현재 부채는 2조 4천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2억 원에 달한다
- 정부는 부채 정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석탄 산업의 막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남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 석탄 산업은 한때 국가 발전의 핵심이었다
- 현재 부채는 2조 4천억 원, 하루 이자 2억 원
- 정부는 부채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석탄공사가 문을 닫으며 한국의 석탄 산업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이 공기업은 한때 산업화의 중추였으나, 부채 문제로 인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석탄은 한때 국가 에너지 자립의 중심이었으나, 도시가스와 석유의 보급으로 그 역할이 사라졌다. 이제 정부는 남은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 석탄 산업은 1950년대 국가 산업화의 심장 역할을 했다
- 현재 부채는 2조 4천억 원으로, 자산보다 현저히 많다
- 정부는 공사의 부채를 관련 기관에 넘기거나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
석탄산업의 종말, 부채만 2조4000억 원 남았다
도시가스 시대 뒤, 탄광촌은 기억 속으로
정부, 청산 방안 고심…결단의 시간이 왔다

대한석탄공사가 올해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문을 닫으면서, 한 세기를 달려온 한국 석탄 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1950년대 국가 산업화의 심장으로 뛰었던 이 공기업은 이제 하루 이자만 2억 원이 넘는 부채에 짓눌려 청산 수순을 밟고 있다. 반세기 전만 해도 탄광의 불빛은 ‘근대화의 불씨’로 불렸지만, 지금은 그 빛이 완전히 꺼진 셈이다.
석탄의 흥망, 산업화를 달군 불씨가 사그라지다
한국의 석탄 산업이 태동한 건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던 1950년대 초였다. 대한석탄공사는 국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설립됐고, 한때 전국 300곳이 넘는 탄광이 쉼 없이 돌아갔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해결, 정부가 나서야 할까?
1980년대 중반엔 무연탄 수요가 2천만 톤을 넘을 정도로 활황이었다. 겨울이면 연탄 트럭이 골목마다 줄을 이었고, 탄광촌은 일자리와 돈이 돌던 지역의 심장이었다.

그러나 도시가스와 석유가 빠르게 보급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연탄 아궁이는 사라지고, 석탄은 ‘과거의 연료’가 됐다.
정부가 처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건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였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비경제적인 탄광을 단계적으로 닫고, 남은 광산만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는 왜 발생했나요?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는 석탄 산업의 쇠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활황이던 석탄 수요는 도시가스와 석유의 보급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탄광의 폐쇄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공사는 생산보다 폐광과 인력 감축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 석탄 산업의 쇠퇴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 퇴직 보상금과 환경 복구비, 이자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 현재 부채는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사라진 일자리를 대신할 산업을 육성하려 했다.
하지만 탄광 지역의 경제는 예전 같을 수 없었다. 강원랜드 같은 대체 산업이 일부 성공을 거두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폐광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석탄공사는 그 뒤로 정책 집행 기관에 가까운 역할을 맡았다. 생산보다 폐광, 복구, 인력 감축에 힘을 쏟으면서 적자는 쌓였다. 수입이 끊긴 뒤에도 퇴직 보상금과 환경 복구비,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났다.
‘하루 이자 2억 원’의 그림자, 남은 빚 누가 갚을 것인가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조 4천억 원대. 이자만 하루 2억 원이 넘는다. 자산은 2천억 원 남짓이라 자체 상환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금리 상승기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이제 정부는 공사의 남은 부채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 혹은 정부가 직접 부채를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바뀌면, 경영 평가나 국회 재무 감시 대상에서 빠지게 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시대를 이끌던 산업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변화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뒤에 남은 부채와 지역의 상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연탄불이 식은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산업의 흥망성쇠’를 목격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정리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