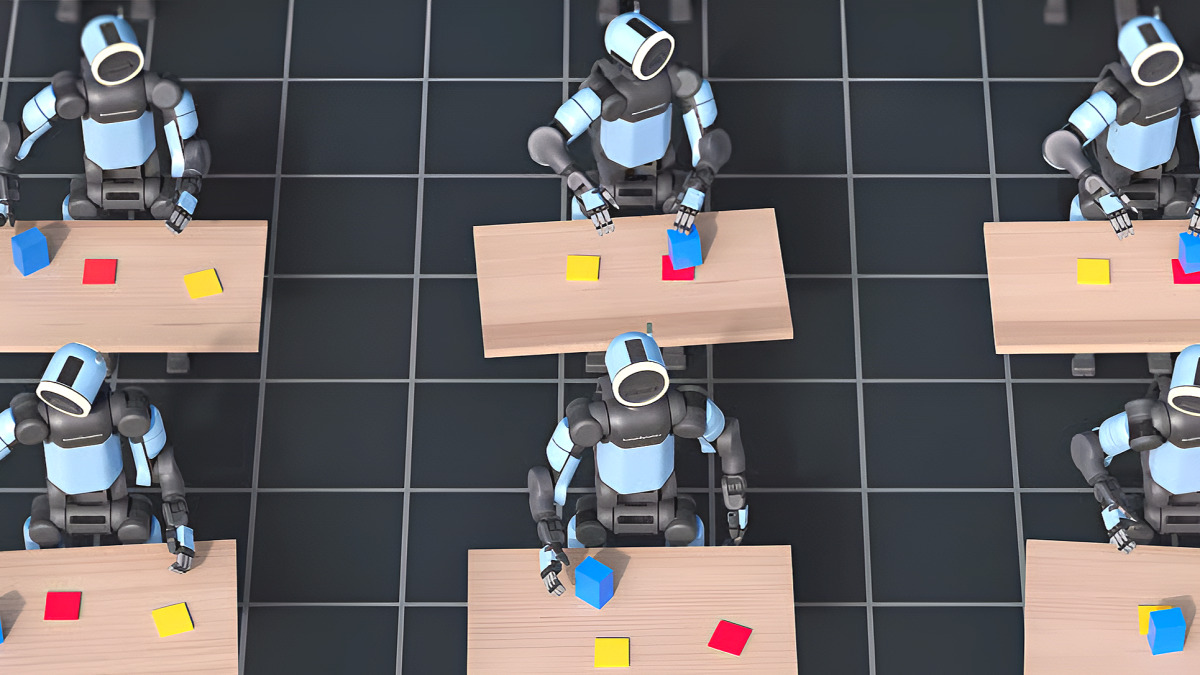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은퇴 후 소득 공백으로 중장년층 생존 위기 가중
- 연금 수급액은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 재취업 시장 경쟁 심화, 고용 불안정
954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소득 공백과 재취업 문제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전 소득 공백 문제 심각
- 연금 수급액이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불과
- 재취업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낮은 임금
- 중장년층의 생계형 취업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시작되면서, 중장년층은 소득 공백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가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0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움
- ‘소득 크레바스’로 인해 60~64세 연령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금 소득이 전혀 없으며, 연금 수급액의 성별 격차도 큼
- 재취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용 불안정 속에서 중고령 장기 근속자의 임금은 이전보다 70% 수준으로 감소
- 65세 이상 취업 연금수급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가 계속됨
은퇴 후 재취업 위해 1년 이상 소요
연금은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에 불과
취업해도 이전 임금 70%만 받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중장년층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부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대에 진입했지만, 평균 퇴직 연령 52세와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사이 긴 ‘소득 크레바스’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은퇴 후 소득 부족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할까?
연금만으론 한 달 살기도 빠듯… ‘소득 크레바스’ 절벽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약 70만 원으로, 1인 최저생계비(124만 6천735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지 않은 ‘소득 크레바스’ 구간인 60~64세 연령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비율은 90.9%에 달했지만, 수급액 분포를 보면 25만~50만 원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 원(31.1%), 100만~200만 원(8.2%) 순이었다. 200만 원 이상 받는 비율은 겨우 5.9%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남성(90만 1천 원)은 여성(51만 7천 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통계청은 “남성은 국민연금, 여성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편인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물가상승률에 모두 영향을 받는 반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되어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소득 크레바스’란 무엇인가요?
‘소득 크레바스‘는 개인이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연령: 평균 52세
-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보통 60세 이후
- 소득 크레바스: 주로 60~64세 사이
이로 인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공백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은 ‘그림의 떡’… 일자리 찾기 ‘전쟁터’

연금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5060세대는 재취업 시장으로 몰리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5세 이후 퇴직자의 재취업까지 평균 15.6개월이 소요된다. 청년들보다 더 오래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유입으로 고령자 취업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됐다.
2023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퇴직자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급여와 직책이 낮다’는 점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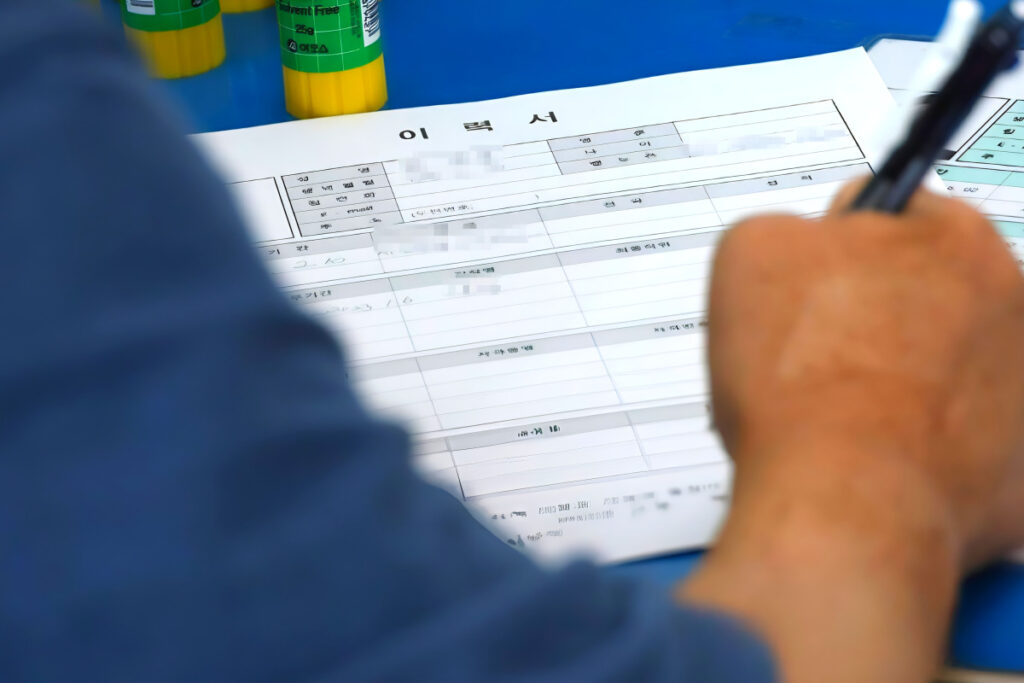
또한 ‘퇴직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응답이 이전보다 13.8% 증가해 재취업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 정년 연장 논의 속에 기업들은 고용 경직성을 우려해 채용을 꺼리고, 공공 부문도 과거 정규직화 정책으로 채용 문이 좁아졌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생계형 노인 취업 증가, 대부분 임금·고용 불안정
그나마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처우는 열악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중고령 장기 근속자가 재취업을 할 경우 이전 직장 대비 임금수준은 약 70%에 불과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은 급감해 60대의 40%가 월 200만 원 이하, 70대의 55%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현실이다.
고용 안정성도 취약해 중고령자의 1년 미만 근속 비율은 34.4%로, OECD 평균(8.6%)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65세 이상 취업 연금수급자는 267만 4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재혁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연금제도가 차곡차곡 쌓여 숙성되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은퇴 세대는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