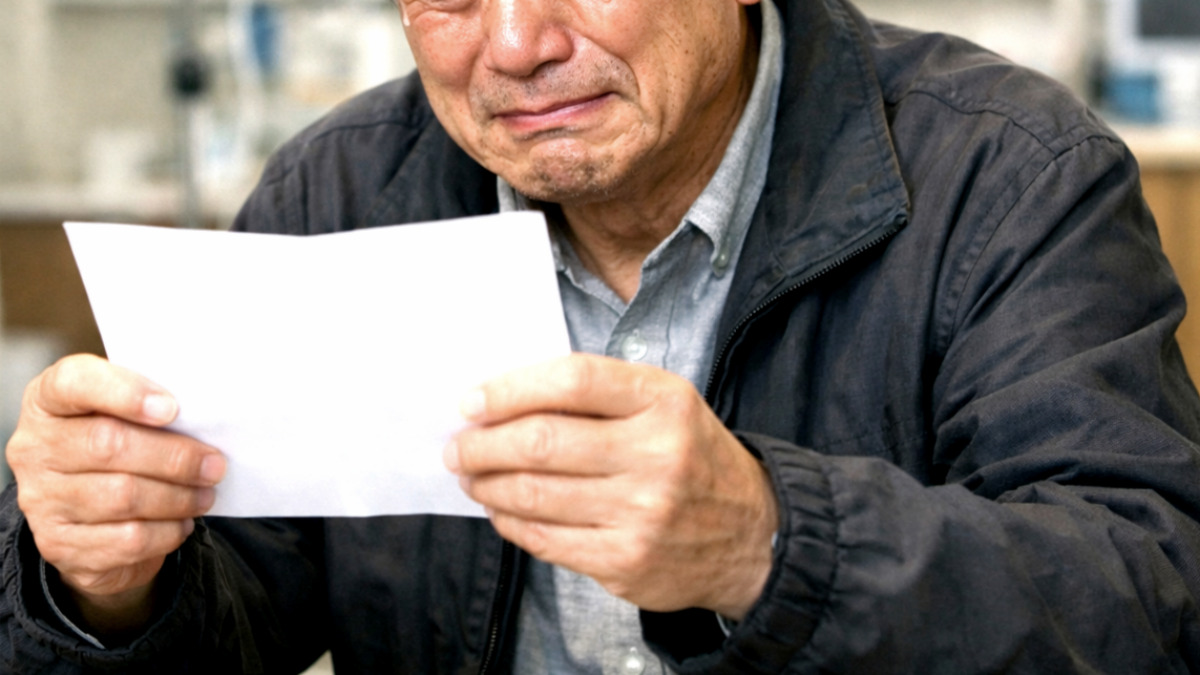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276만 명,
8명 중 1명은 법정 임금도 못 받는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현실은 더 심각해진다

“공고엔 시급 준다더니, 막상 가보니 딴소리 하더라고요.”
지난달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던 대학생 박모 씨는 면접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 시급 10,030원으로 공고가 올라왔지만, 주휴수당은 없고 근무일수도 들쑥날쑥할 거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박씨는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인데, 당연히 주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거 다 챙겨주면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어요”라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찜찜함이 너무 컸죠”라고 말했다.
‘최저’도 못 받는 현실… 8명 중 1명, 법정 임금 미달
이처럼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276만 1천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보다 25만 명 줄었고, 미만율은 1.2%포인트 하락하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뿌리 깊다. ‘최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 현실. 숫자는 내려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업종·규모 따라 달라지는 ‘법의 온도차’
격차는 업종에 따라 훨씬 심각해진다. 숙박·음식점업은 무려 33.9%, 농림어업은 32.8%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반면 일부 업종은 1~2% 수준에 그치면서,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에 달했다.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업종까지 포함하면 그 격차는 55.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는 더 두드러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9.7%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300인 이상)은 2.5%에 불과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현실을 수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숨겨진 사각지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더 심각
한편,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다시 계산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현행 최저임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미지급 실태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총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자는 467만 9천 명, 미만율은 21.1%로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숙박·음식점업은 51.3%, 5인 미만 사업장은 44.7%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고려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이 정한 최저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한 만큼 존중받을 권리’의 시작점이다. 지난해의 통계는 개선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밀함이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그 시작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