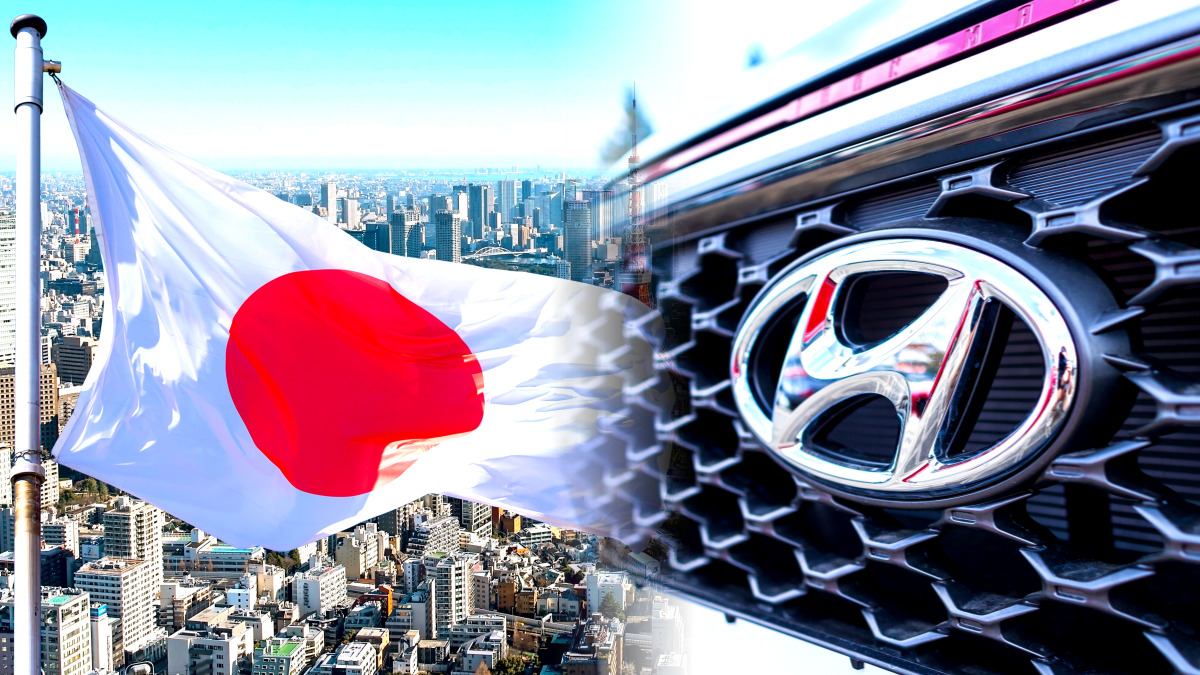사기 전엔 “멈출까 봐” 불안, 타면 금세 잦아든다
미국 48%→22%, 한국도 충전 경험이 걱정을 낮춘다
하지만 한국은 ‘충전 자리·안전’이 더 큰 불안으로 남는다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면 비슷한 상상이 떠오른다. 출퇴근은 충분해 보여도 주말 장거리나 야간 이동이 겹치면 “배터리가 떨어져 길에서 멈추면?”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바로 주행거리 불안이다.
그런데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흥미로운 점은, 이 불안이 실제 소유 이후 생각보다 빠르게 누그러진다는 것이다.
충전 번거로움이 ‘벽’이었다…한국 EV 소비자는 왜 달리 느끼나
미국 플러그인아메리카 자료를 토대로 한 리서치에서는 구매 전 지속적인 불안을 느낀 비율이 48%였지만, 실제 소유 후에는 22%로 낮아졌다.
2023년 조사에서도 전기차 오너의 78%가 “경험이 쌓일수록 불안이 줄었다”고 답했다. 처음엔 지도 위 충전소와 계기판 숫자로 미래를 계산하지만, 몇 주만 타보면 내 동선과 소비전력이 보이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힘을 잃는다는 의미다.

한국도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사용자 조사에서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1위가 ‘충전의 번거로움(36%)’,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충전 인프라 부족(28%)’이 상위에 오른다.
반면 실제 차주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할 만하다”는 체감이 늘고, 재구매 의향이 80%대라는 결과도 나온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실제 주행에서 평균 주행거리 사용률이 12.6%에 그쳐, 대부분의 날 배터리 여유가 상당히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엔 불안해서 100% 충전을 고집하던 운전자도 생활 패턴을 확인한 뒤에는 80%만 채워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불안이 줄어드는 건 차가 갑자기 달라져서가 아니라, 운전자가 ‘내가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행거리보다 ‘충전 자리’가 더 무섭다”…아파트가 만든 한국형 불안

다만 한국의 불안은 거리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 비중이 높은 환경에서는 “퇴근 후 충전 자리가 있을까”라는 경쟁 스트레스가 주행거리 걱정과 맞물린다. 충전 구역이 꽉 차 있으면, 남은 주행거리가 많아도 마음은 급해진다.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 보도 영향으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차량 가격과 충전요금 부담까지 더해지며 고민의 초점이 ‘멀리 가는 능력’에서 ‘안심하고 쓰는 조건’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보인다.
경험이 불안을 줄이려면 충전 접근성과 안전 신뢰를 함께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를 둘러싼 질문이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지, 소비자들의 체감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