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축의금, 이제는 10만 원이 기준
“5만 원 내면 눈치 준다”는 분위기 확산
참석 여부도 계산하는 직장 내 결혼 문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회사 동료 C 씨의 결혼식에 다녀온 직장인 B 씨의 씁쓸한 경험담이 전해졌다.
같은 부서도 아니고, 평소 사적으로도 큰 교류는 없었지만, 청첩장을 받은 만큼 예의를 갖추고 참석했다. 식장까지 먼 길을 가야 했지만 정장을 챙겨 입고 주말에 시간을 냈다.
축의금은 5만 원을 봉투에 넣었다. 식사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신랑 신부에게 밝은 얼굴로 축하 인사도 전했다.
며칠 후, 회사 복도 끝 탕비실에서 마주친 익숙한 목소리에 B 씨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니, 5만 원 내고 밥 먹고 간 거면 그냥 오질 말지. 민망하게…” 누군가 나지막이 한숨 섞인 말투로 말했다.

웃음이 섞인 대화였지만, 그 뒤에 깔린 뉘앙스는 날카로웠다. 이어진 말들 속에서 B 씨는 자신이 이야기의 대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간 자리였는데, 축의금 액수로 뒷담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안 가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B 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밥까지 먹었으면 10만 원?”…직장인 축의금, 새 기준 생겼다
직장 내에서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풍경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최근 인크루트가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기준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까지 하는 경우 적정 축의금은 ’10만 원’이라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만 원’이 32.8%, ‘5만 원 미만’이 3.2%에 불과했다. 특히 ‘사적으로 친한 동료’와 ‘업무로 엮인 동료’ 관계 모두에서 10만 원이 1순위를 차지해, 인간관계의 밀도와 상관없이 10만 원이 하나의 기준선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협업 동료에게 적정하다고 여겨졌던 5만 원 응답이 65.1%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변화다.
IMF와는 정반대 흐름…축의금도 ‘인플레이션’
현재의 축의금 상승 추세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축의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1회 평균 축의금은 IMF 이전 38,400원에서 29,700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사회적으로는 ‘축의금 1만원 이내 주고받기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검소한 경조사 문화가 확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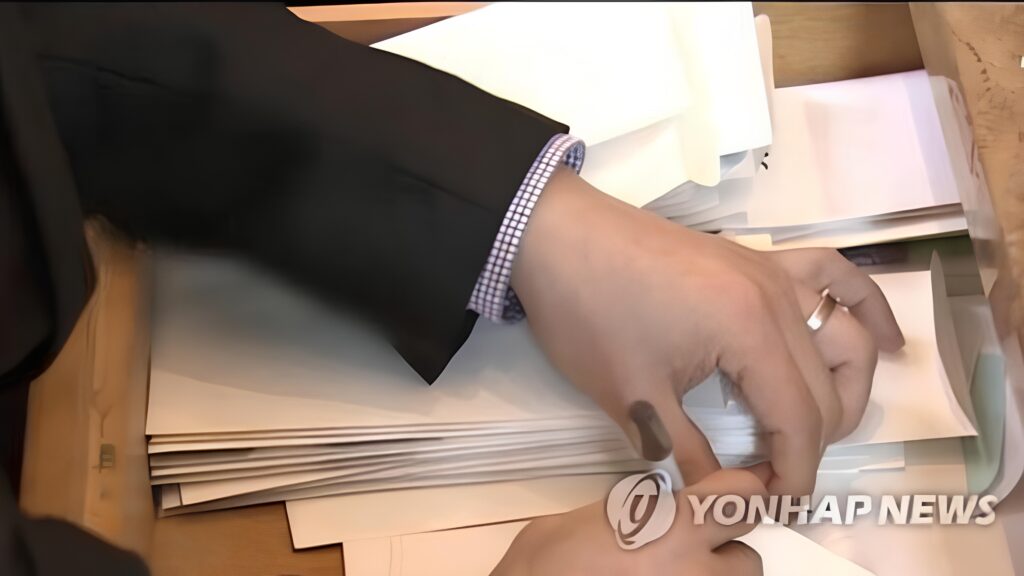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물가 상승과 함께 축의금도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 직장인은 “요즘은 5만 원 냈다 하면 눈치 주는 문화가 있어, 안 친해도 10만 원은 기본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결혼식이 축하 자리가 아니라 계산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축의금 눈치 전쟁에 상처받는 직장인들
결혼식 참석 범위도 좁혀지는 추세다. ‘협업하는 동료’의 결혼식엔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고, ‘청첩장을 받은 모든 동료’는 28.2%, ‘사적으로 친한 동료’는 25.9%였다.
반면 결혼식에 불참하는 이유로는 ‘결혼식까지 참석할 사이는 아니어서'(33.3%), ‘개인 일정 우선'(25%), ‘축의금 경제적 부담'(16.7%) 등이 꼽혔다.

과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만은’ 전하려 했던 축의금 문화와 달리, 이제는 액수가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
축의금이 축하의 의미보다 관계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수단이 되어가는 지금, 서로의 형편과 진심을 존중하는 직장 문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잘 알지도 못하는 주는게 이상한 놈이지
저러니까 참석해줘도 욕먹고 저러것들한테는 안가고 안줘야함!
결혼도 양가 가족끼리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