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예산 115조로 두 배 증가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
“예산보다 전달 방식 점검할 때”

“예산이 두 배나 늘었다는데, 정작 현실은 왜 그대로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돈을 써도 빈곤율이 1위라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노인 복지에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상대적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예산 규모만 보면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정작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총 229조1천억 원. 이 중 노인 복지 분야에만 115조8천억 원이 배정됐다. 전체 예산의 50.6%다.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기초연금부터 공적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다양한 복지 정책이 확대된 덕분이다. 하지만 이 예산이 실제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빈곤율 OECD 1위…쏟아붓는 예산, 가닿지 않는 체감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8%. OECD 38개국 중 가장 높다.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평균 이하지만, 노인층만 따로 보면 상황이 심각하게 다르다. 무엇보다 이 수치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오르고 있다. 예산은 늘고 있는데, 빈곤율도 함께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한다. 주변과의 비교 속에서 체감되는 ‘가난’을 보여주는 지표로, 단순한 소득 부족을 넘어 사회적 소외와 생활 불안까지 포함한다.
어디에 어떻게 썼나…‘현금’보다 ‘일자리’ 늘어난 복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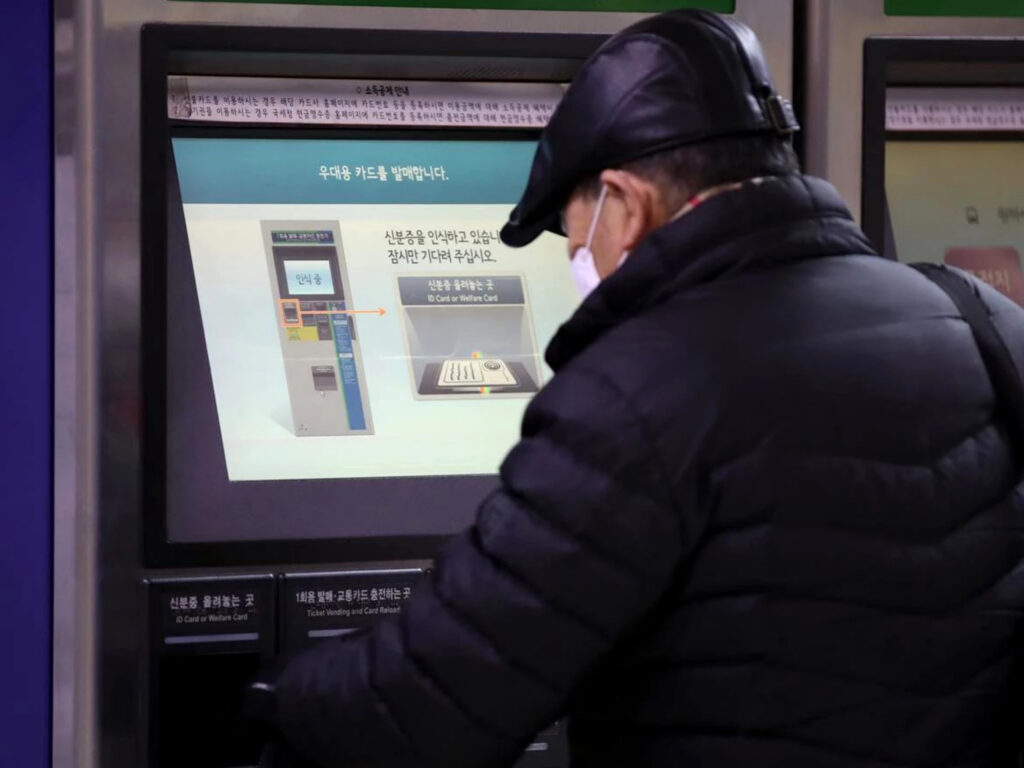
그렇다면 올해 늘어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을까?
115조 중 가장 큰 몫은 공적연금이 차지한다. 전체 노령 예산의 76.3%가 여기에 들어갔다. 특히 국민연금 비중은 2018년 44.3%에서 54.8%로 크게 늘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인 생활 안정’ 예산은 21.5%. 이 중에서도 기초연금이 8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고 있다.
대신 크게 늘어난 항목은 ‘노인 일자리 사업’. 2018년 6천억 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은 2조2천억 원까지 뛰었고, 전체 노령 예산의 8.8%를 차지하게 됐다.

지방도 예산을 늘렸지만…재정 취약 지역은 여전히 한계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중 31.2%가 노령 분야였지만, 올해는 34.5%로 증가했다. 문제는 지역별 편차다.
고령화율은 높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여전히 복지사업 자체를 벌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예산 증가만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송창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금 지원을 넘어 일자리와 사회 참여 확대 같은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처럼 예산은 늘었지만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전달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급자 도 기초연금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