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군 중간 간부의 대규모 이탈
- 신규 임관율 급감
- 공군 정비 인력 유출
군의 핵심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중간 간부의 희망 전역과 휴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부사관과 장교의 신규 임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육사 임관율이 급감했습니다.
- 공군 정비 인력의 민간 유출이 심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군 병력 감소와 함께 중간급 간부의 대규모 이탈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인력 구조에 큰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공군의 정비 인력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임관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 간부들의 전역과 휴직이 증가했습니다.
- 부사관과 장교의 신규 임관율도 급감했습니다.
- 육군 사관학교의 임관율이 67.6%로 감소했습니다.
- 공군의 무기 정비 특기 부사관의 민간 유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간급 군 간부 붕괴 위기
사관학교도 임관율 급감
공군 정비 인력 유출마저

저출산으로 인한 군 병력 감소 문제가 작지 않은 가운데 군의 핵심 인력 유출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붕괴 위기 직면한 군의 중간급 간부

국방부 측 자료에 따르면 임관 10년 이상 20년 미만 부사관·장교들의 희망 전역과 휴직 건수는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 전역 인원은 2021년 960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821명을 기록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총 1,327명의 중간 간부가 희망 전역했다.
여기에 휴직 인원 역시 2021년 2,252명에서 지난해 3,41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총 3,401명이 휴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간급 간부라는 점에서 군 인력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최근 5년간 부사관 신규 임관은 2021년 1만550여명에서 지난해 6,750명으로 급감했으며 장교 신규 임관도 2021년 4,860여명에서 지난해 3,980여명으로 감소했다.
사관학교마저 흔들리는 신임 장교 임관

이처럼 군의 간부 인력 문제는 육군 사관학교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그동안 육군 사관학교는 군의 최고 엘리트 코스로 손꼽혔으나 올해 임관한 육사 인원은 정원 대비 67.6%에 그쳤다. 사실상 3명 중 1명이 임관을 포기한 셈이다.
특히 육사 임관율은 지난해까지 80% 이상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67%대로 급감하였으며 3사관학교 역시 지난해에는 85% 이상의 임관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65.5%로 급감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처럼 장교 임관율이 급감한 이유로 군 전문가들은 병장들과의 급여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병장의 경우 기본급이 150만 원 수준이지만 내일 준비 적금을 통해 실수령은 205만 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이는 초임 소위가 받는 약 201만 원의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육군은 타군 대비 격오지 근무 확률이 높다는 점이 더해지며 장교 임관에 대한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왜 군의 간부 임관율이 급감했나요?
군의 간부 임관율이 급감한 주요 원인은 급여 격차와 근무 환경 때문입니다.
- 병장과 장교 간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 육군은 격오지 근무 확률이 높아 장교 임관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공군의 조종사 정비 인력 유출

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간 간부의 이탈 못지않게 공군 내에서는 정비사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측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정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 정비 특기’ 부사관 가운데 희망 전역을 한 부사관의 수는 2016년 7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215명을 기록했다. 이는 8년 사이에 2.9배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해엔 공군 전체의 희망 전역 부사관 중 무기 정비 특기가 가장 많은 비중인 44%를 차지하기도 했다.
무기 정비 특기 부사관의 경우 민간 항공사나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공기 정비를 맡는 이들은 조종사와 더불어 공군력 유지의 핵심 역할을 맡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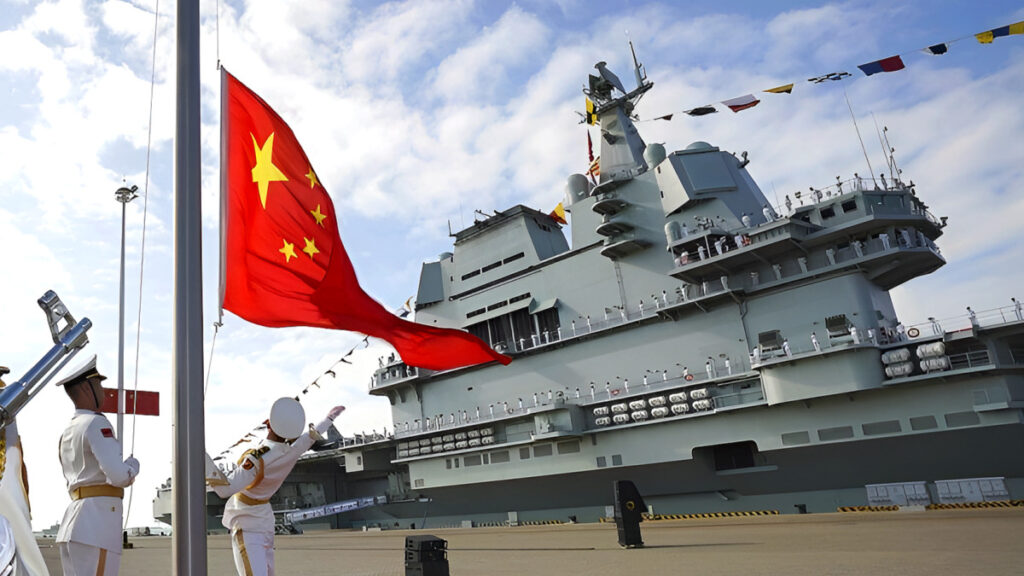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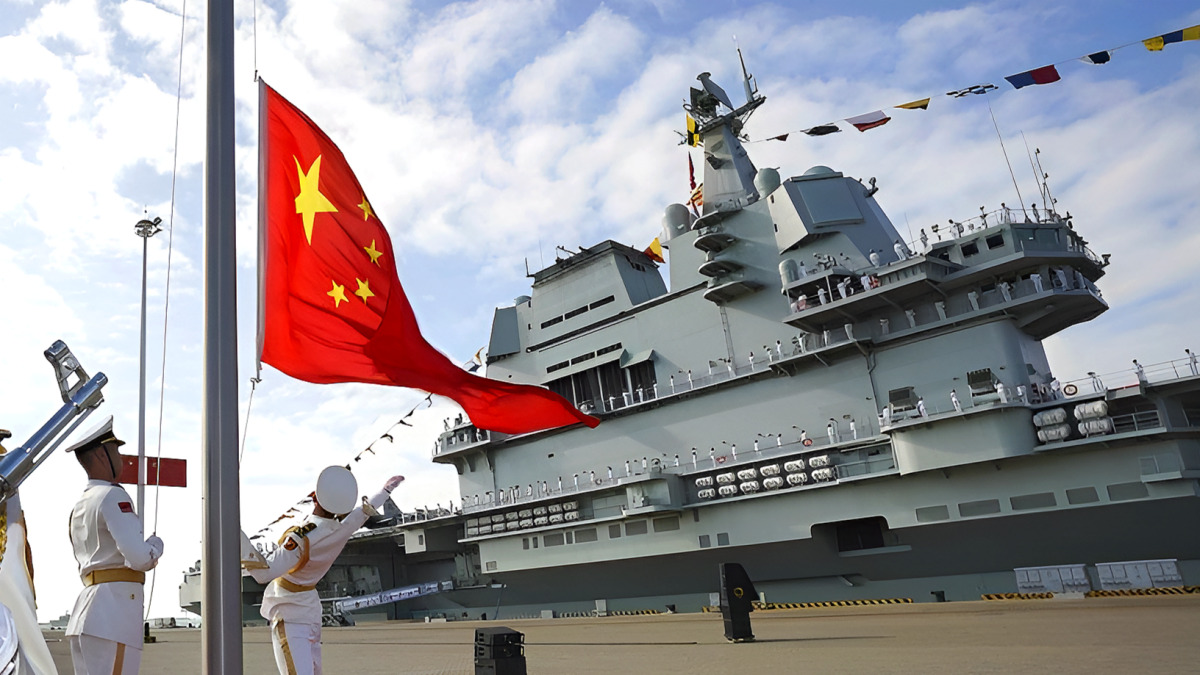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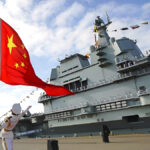








또 다시, 6.25전쟁과 같은 꼴을 당하려고 작정한 것이다
장교사관학교ㅡ군종별 로만들라 ㅡ학사등등다없애구조군종별종사관학교를만들어 통합해라 생산성잇게ㅡ
개나소나 사병들월급올려주고 복무기간 단축하고 이것들 주도한 인간들은 모조리
개돼지가 나라를 이꼴로만들어놓고 알콜중독돼지세끼 사형시키야된다
있을때, 잘 관리했어야지요. 세월호,이태원사고 다. 막을수 있었던거데, 청년들의 죽음이 안타깝네요
중국세력 국내 득세로 의도적 국군약화가 걱정되네
육사 폐교하고
보병과 햬군과 공군과 해병과로 종합사관학교로 개칭하라
국민세금으로 쿠테티 내란세력 양성하는 육사는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