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결국 1%대 진입
고령화·투자둔화에 성장엔진 식었다
이젠 작은 충격에도 경제가 휘청인다

한국 경제의 실질적 성장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 ‘잠재성장률’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때 고성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주요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1%대가 현실”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까지 낮춰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026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했다.
이는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이 2%도 어렵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하락 추세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KDI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대엔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외부 충격을 버텨낼 체력도, 성장을 가속할 여유도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충격에 약해진 경제, 쓰러지기 쉬운 구조

잠재성장률 하락은 성장 둔화를 넘어,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더욱 민감해졌다는 경고다. 출력이 낮은 엔진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당시, 잠재성장률이 5%대였던 중국은 성장률이 3%포인트 하락했음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지만, 2%대에 머물던 한국은 -0.7%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낮아진 상황에서는, 작은 불확실성에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좁아진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의 덫, 돌파구는 없을까

이처럼 한국 경제의 ‘출력 저하’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투자 위축, 그리고 기술·효율성 정체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은퇴세대의 저축 감소는 투자 자금의 흐름까지 막고 있다.
여기에 인적 자원의 질적 쇠퇴까지 겹쳤다. 젊은층 비중이 줄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흡수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R&D 투자 확대, 인력 재교육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높았던 잠재성장률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됐다. 더 이상 2~3% 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1%대마저 ‘지켜야 할 선’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엔진을 갈고 닦아야 할 시간이다. 안일한 대응은 더 큰 충격을 부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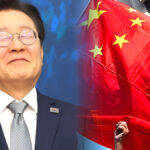



우리 국민이 자초한것 한국의미래는 불투명하다 국민성이 아프리카 후진극보다 못하다 친일파들에게 빌부터 살았던 형태를 지금도하고있다
일하기실은 국민성 불법노동자는부자되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