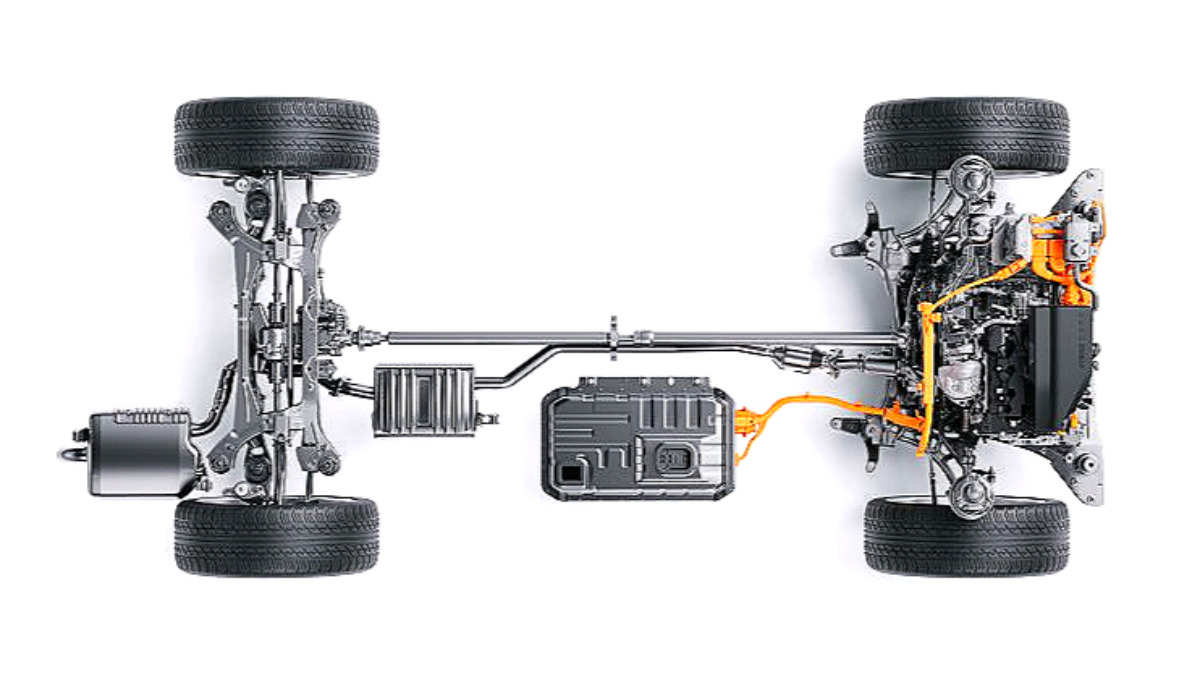“이제 한국에 안 살면서 집만 사두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의 ‘아파트 쇼핑’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라는 강력한 족쇄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던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9~12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1,481건으로 전년 동기(2,279건) 대비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경우 거래량이 243건으로 집계돼 1년 새 51%나 줄어들었다.
‘갭투자’ 큰손 중국인, 직격탄 맞았다

이번 규제의 최대 타깃은 단연 중국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중국인의 비중은 약 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인들은 미국인(주로 단독주택 실거주)과 달리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는 ‘다주택 갭투자’ 성향이 강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규제 효과는 중국인 투자가 집중된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천의 경우 지난해 9~12월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102건에 그쳐 전년 동기(208건) 대비 51% 급감했다.
안산과 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역시 거래 절벽을 맞았다. 국적별로 봐도 중국인의 거래량은 1,053건으로 32% 줄어든 반면, 미국인은 45% 감소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자본이 대거 이탈했음을 시사한다.
“내국인 역차별 해소” vs “풍선효과 우려”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대출 규제(LTV)와 다주택자 세금 폭탄으로 옴짝달싹 못 하는 사이, 외국인들은 자국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 없이 아파트를 사들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도 허가 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빈틈을 노린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외국인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이나 빌라, 또는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외곽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운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