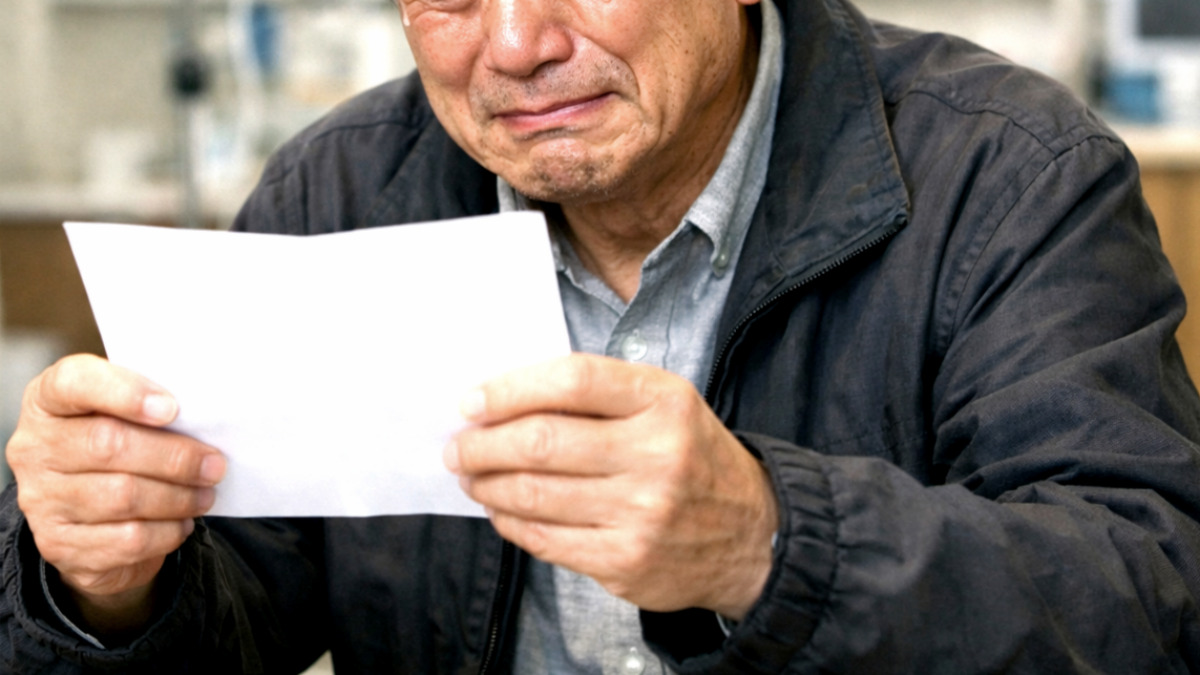한국 건설업 사망률, OECD 10개국 중 압도적 1위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빨리빨리’ 문화가 안전 잠식
고령화·솜방망이 처벌까지 겹쳐 근본 대책 절실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심각하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 지표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 1.59를 기록해, 조사 대상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OECD 10개국 평균이 0.78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영국(0.24)과 비교하면 무려 6.6배 차이가 난다.
쉽게 말해 영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한 명이 목숨을 잃을 때, 한국에서는 여섯에서 일곱 명이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속도에 목매는 ‘빨리빨리’, 노동자의 생명을 깎아먹는다

건설업은 본래 위험이 큰 산업이다. 옥외 작업이 많고, 복잡한 구조물 속에서 다양한 인력이 협업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수치는 단순히 업종 특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구조적·문화적·제도적 요인이 얽혀 있는 복합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 그 아래 반장과 팀 단위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공사 비용은 단계마다 깎여 나간다.
최종적으로 현장 작업자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안전 장비와 보호 장치에 제대로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도 문제다.

원청은 하청으로, 하청은 재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현장에서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도 안전을 위협한다.
공사 기간 단축이 곧 비용 절감과 성과로 여겨지면서, 악천후 속에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안전 절차를 생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장에서는 안전보다 속도가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고령화·언어 장벽에 흔들리는 현장 안전망
인구 구조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건설 현장은 대표적인 고령화 산업으로, 50대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 신체적 반응 속도와 위험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노동자들은 사고에 더 취약하다.

안전 관리와 감독 시스템의 허술함도 뚜렷하다. 현장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받는 처벌은 오랫동안 솜방망이에 가까웠다.
‘안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낫다’는 인식이 기업에 만연했던 이유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책임이 강화되었지만, 아직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한국 건설업의 높은 사망률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성과 중심의 문화,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취약한 근로 환경, 부실한 안전 관리 제도가 얽혀 만들어낸 현실이다.
보고서는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 대책과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이어지는 죽음의 기록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