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 한국 조선업계 반사이익 기대
- 장기적 해운 지형 변화 가능성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입항 수수료를 도입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중국산 선박, 미국 항만 입항 시 높은 수수료 부과
- 입항 요금은 2028년까지 인상 예정
- 한국 조선소, 기술력과 동맹국 프리미엄으로 경쟁력 강화
미국이 중국 조선업계를 겨냥하여 새로운 무역 전략을 도입함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정학적 요소와 산업 전략이 맞물린 중요한 변화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입항 수수료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미국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순톤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2028년까지 140달러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특히 중국에서 지어진 선박은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되며, 이는 중국산의 경제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이로 인해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동맹국 프리미엄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 현재 머스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프로젝트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폭탄 예고
‘선박법’ 맞물리면 K조선 반사이익 기대
장기전 돌입한 해운 패권, 힘의 축이 흔들린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정조준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는 단순한 항만 요금이 아니다.
지정학과 산업 전략이 맞물린 새로운 무역 전선의 개막이다. 그 여파 속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긴장과 기대 속에 주시하고 있다.
미, 중국산 선박에 ‘입항세 폭탄’…조선 패권 흔든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자국 항만에 들어올 때 순톤(net ton)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2028년에는 140달러로 인상한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는 효과적일까?
특히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은 톤 기준과 컨테이너 기준 중 더 비싼 금액을 내야 한다.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항 수수료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항만 이용료나 환경 부담금은 국적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중국 소유·운항·건조’라는 조건이 명시됐다.
여기에 단계적 인상 로드맵까지 더해져, 선주들의 장기 전략을 흔드는 구조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비싸진다”는 신호나 다름없다. 이런 예고형 제재는 흔치 않다.
또한 중국에서 지어진 선박은 두 가지 요율 중 높은 쪽을 적용받는다. 설계 단계부터 중국산의 경제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 미국의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는 무엇인가요?
미국은 중국에서 건조되거나 소유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는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수수료는 순톤당 50달러이며, 2028년까지 14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이번 조치는 중국 조선업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SHIPS for America Act(선박법)’이 통과되면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이 미국과 동맹국 조선 산업 지원에 쓰인다. 중국의 부담이 한국 등 동맹국의 기회로 바뀌는 셈이다.
미·중 해운 전쟁 속 ‘K조선’ 반사이익 시동

전 세계 선박의 70% 이상을 중국이 건조하고 있지만, 미국 항로를 운항하는 선주들은 새로운 계산에 들어갔다.
일부는 중국산 선박을 미주 대신 유럽이나 아프리카 노선으로 돌리고 있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반사이익 기대감에 들썩인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는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동맹국 프리미엄’을 무기로 삼는다.
실제로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가 추진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프로젝트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다. 선박 발주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이 많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일시적 제재가 아니라 장기 구조 변화를 노린 설계형 규제다. 인상 곡선과 이중 기준, 선박법이 맞물리면 중국 조선업의 가격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례적 구조의 정책이 세계 해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아직 결과를 단정하긴 이르지만, 힘의 축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향후 바다 위의 질서가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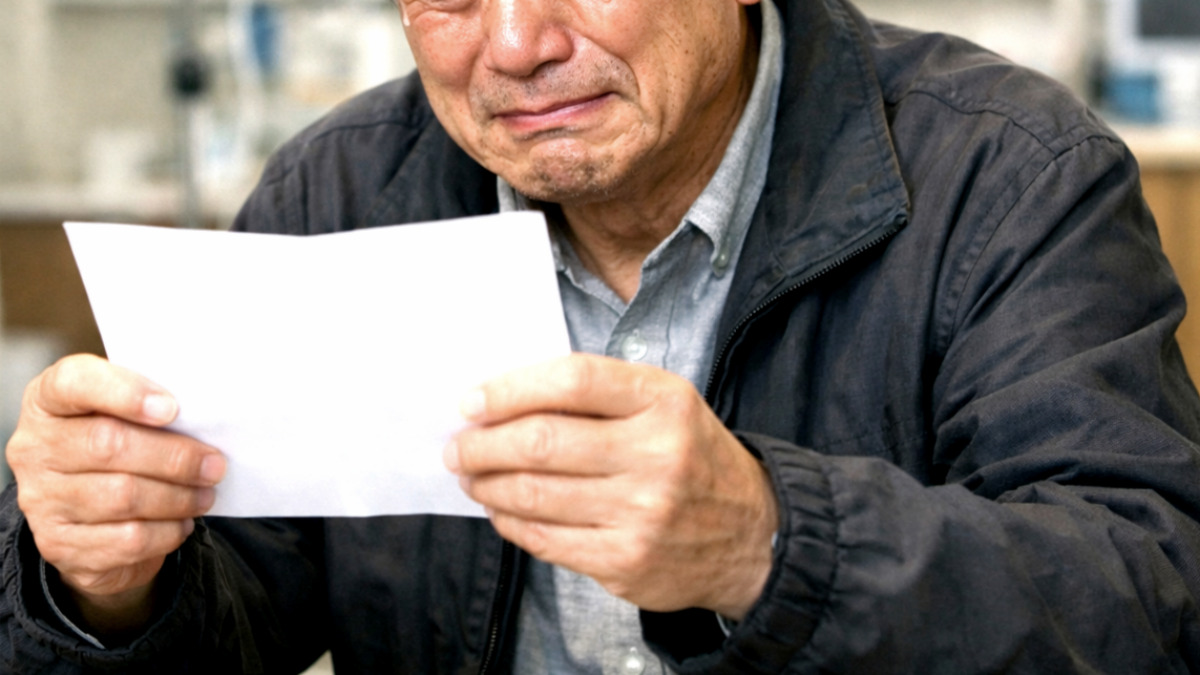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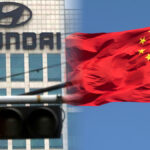

효과적이다
중국을 해체시키겠다는 논리 아닌가요?
미국은 전쟁 일으켜 자국 실업률,경기,금리 다 잡으려 중국을 계속 자극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