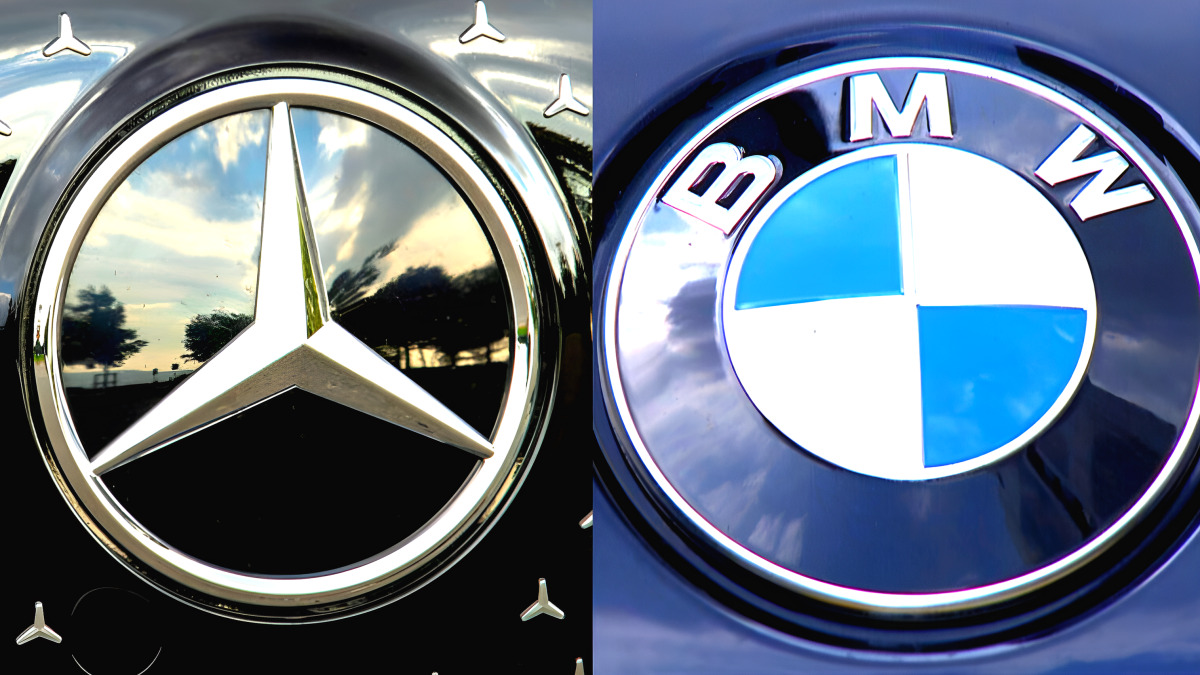“시끄러운 아반떼 왜 타냐” 멸시·부진한 내수… ‘미운 오리’였던 N 브랜드
안 팔려도 포기 없었다… 10년 ‘달리는 연구소’ 데이터, 제네시스로 이식
포르쉐 넘보는 650마력 ‘GV60 마그마’… 뿌리는 벨로스터·아반떼 N의 눈물

“동네 시끄럽게 왜 저런 차를 타냐”, “그래봤자 아반떼 아니냐”, “양카(양아치 카)의 대명사다”.
지난 10년간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이 국내 시장에서 들어온 말들이다. 해외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펀 카(Fun Car)”라고 극찬받았지만, 한국 시장은 냉담했다. 판매량은 처참했고, 도로 위에서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하지만 그 ‘설움’의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현대차가 무시와 조롱을 견디며 갈고닦은 N의 기술력이 제네시스의 하이엔드 고성능 라인업 ‘마그마’로 화려하게 만개했다.
“돈도 안 되는데 왜 하냐”… 내수 시장의 철저한 외면
현대차 N 브랜드의 국내 성적표는 초라했다. N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았던 ‘벨로스터 N’은 저조한 판매량 끝에 단종의 비운을 맞았다.

‘아반떼 N’ 역시 연간 판매량이 1,000~2,000대 수준(국내 기준)에 머물렀다. 한 해 수십만 대를 파는 현대차 전체 실적에서 보면 ‘오차 범위’ 수준의 미미한 숫자다.
도로 위 인식은 더 가혹했다. 배기음(팝콘 사운드)은 소음 공해 취급을 받았고, N 오너들은 ‘폭주족’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다. 수익성만 따지는 경영 논리대로라면 진작에 접었어야 할 사업이었다.
‘미운 오리’가 품었던 백조의 꿈… N은 ‘달리는 연구소’였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과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N 브랜드를 판매용이 아닌 ‘달리는 연구소(Rolling Lab)’로 정의했다.
벨로스터 N과 아반떼 N이 서킷을 돌며 타이어를 태울 때, 현대차는 극한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코너를 돌 때 안쪽 바퀴를 제어하는 ‘e-LSD’ 기술, 가혹한 주행에도 배터리와 모터의 열을 식히는 ‘열 관리 시스템’, 운전자에게 변속 충격을 주는 듯한 ‘N e-쉬프트’ 감성까지.
이 모든 기술은 “돈 안 되는 차”라고 무시당하던 N 모델들을 통해 완성됐다. 대중이 손가락질할 때, 엔지니어들은 그 속에서 포르쉐를 잡을 칼을 갈고 있었던 셈이다.
마침내 터진 포텐… ‘양카’의 심장이 ‘럭셔리’를 입다
13일 출시된 ‘GV60 마그마’는 그 인고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다. 제네시스라는 우아한 껍질 안에, N 브랜드가 피땀 흘려 만든 ‘야수성’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GV60 마그마가 기록한 제로이백 10.9초와 650마력의 출력은, 과거 벨로스터 N이 뉘르부르크링을 돌며 엔진을 터뜨려가며 얻은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했다.

과거 ‘동네 시끄러운 차’의 기술이 이제는 ‘포르쉐 마칸’을 압도하는 1억 원대 럭셔리 카의 핵심 경쟁력이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GV60 마그마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차가 아니다”라며 “국내 시장의 멸시와 저조한 판매량을 견뎌낸 N 브랜드의 ‘뚝심’이 없었다면, 제네시스는 여전히 ‘점잖은 회장님 차’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카’라고 놀림받던 미운 오리 새끼가, 마침내 ‘마그마’라는 이름의 불사조가 되어 날아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