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차장 인식 시스템 교체비 ‘독박’…“숨은 세금”
정부 ‘망신 주기’ 1년 만에 흔들…법인차 판매 16.5% 반등
“색깔놀이 말고 세법 손질”…보여주기 행정 비판

윤석열 정부가 ‘법인차 사적 유용 근절’을 내걸고 도입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도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대규모 예산 편성 없이 ‘번호판 색상 변경’만으로 규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뀐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한 시스템 교체 비용을 민간과 지자체에 전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규제 효과마저 사라지고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으로 변질되면서 정책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 예산 아꼈다? 민간에 떠넘긴 ‘사회적 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가장 큰 비용을 치른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었다. 번호판의 색상과 반사율, 문양 등이 기존과 달라지면서, 전국의 아파트, 쇼핑몰, 병원, 유료 주차장 등은 차단기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국의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LPR) 업데이트 및 노후 장비 교체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한다.
최신 장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가능하지만(대당 수십만 원), 노후 장비를 쓰는 구축 아파트나 영세 상가 등은 하드웨어를 통째로 교체해야 해 수백만 원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서 발생한 비용을 별다른 지원 없이 민간에 ‘외주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홍글씨’가 ‘명품 로고’로… 빗나간 예측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도입했지만, 정책의 핵심 목표였던 ‘심리적 압박(낙인 효과)’은 유효기간이 1년도 채 가지 못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를 보면, 올해 억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4만 1,155대로 전년 대비 16.5% 급증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30% 넘게 급감하며 효과를 보는 듯했으나, 시장이 연두색 번호판에 적응하자마자 판매량이 ‘V자 반등’한 것이다.
오히려 강남 등 부유층 밀집 지역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를 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오너”를 인증하는 수단으로 인식이 뒤바뀌었다. 규제를 위한 표식이 명품 가방의 로고처럼 ‘과시의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의 한계… 세법 개정이 답”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으려면 번호판 색깔을 바꿀 것이 아니라, ‘비용 처리 한도’를 손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 일지 작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거나, 차량 가액에 따라 비용 처리 상한선을 낮게 둬 고가 차량의 법인 등록 유인을 원천 차단한다.
반면, 한국은 연두색 번호판만 달면 여전히 차량 구매비와 유지비를 법인 비용으로 털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절세 혜택’이 ‘쪽팔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번호판 색상 변경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민간에 불필요한 시스템 교체 비용만 유발하고, 정작 탈세는 막지 못한 채 수입차 업계에 ‘연두색 마케팅’ 기회만 열어줬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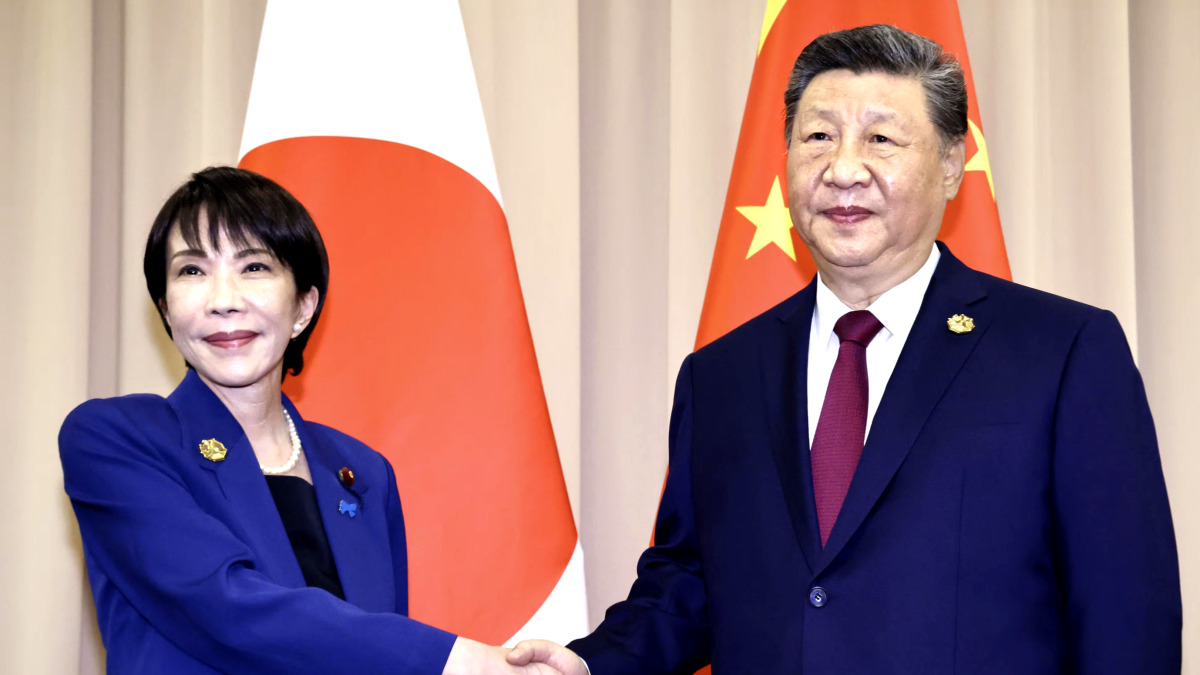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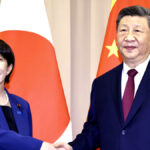

없애라
부자 자녀들의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개인용도 사용은 줄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