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선박 주문에 한국 조선업 ‘기지개’
LNG·중형선박 수요 폭증…현지 진출 기회
美 해군 협력·인프라 투자 논의도 본격화

한국 조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 들려온 선박 발주 소식이 업계 전반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산업 재건을 공식화하면서, 그 여파가 국내 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美 조선 부활 선언…448척 ‘초대형 발주’ 예고
이번에 미국이 내놓은 계획은 전례 없이 대규모다. 2037년까지 상선, LNG 운반선, 해군 군함, 쇄빙선 등 최대 448척의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이다.
448척의 선박 건조 금액은 시장 상황, 환율, 선종별 사양에 따라 변동되지만 약 450억~1,300억 달러(한화 약 60조~175조 원)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이 정책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일종의 산업 선언이다.
하지만 막대한 수요에 비해 자국 내 조선소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자연스럽게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도 이 흐름에 주목했다. 미국 전략상선단 확충의 핵심은 1천~6천TEU급 중형 선박인데, 이는 바로 한국 조선소들의 주력 분야다.
민관이 손을 잡고 미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한다면, 새로운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진단이다.

LNG 운반선도 유망한 영역이다. 미국의 LNG 수출 확대에 따라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미국 내에서 소화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美 현지화” 선점이 열쇠…韓 조선업, 인프라·인력 총력전
보고서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 거점을 조성하고 협력 체계를 갖춘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함 분야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기체계가 연계된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체 정비나 보수부터 단계적으로 진입해 신뢰를 확보하고, 이후에는 수송함·지원함 등 비전투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 같은 산업 협력이 효과를 보려면 인프라 정비와 인력 양성도 병행돼야 한다.

미국 내 조선소의 생산성을 높이고, 한국 기업이 인수한 조선소와 주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내 인력 유출에 대비한 교육과 양성 시스템도 장기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한국 조선업 앞에 놓인 건 수주 기회를 넘어선다. 산업 판 전체가 다시 짜이고 있다.
미국발 대형 발주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면, 국내 조선업은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글로벌 조선시장 한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잭팟’을 터뜨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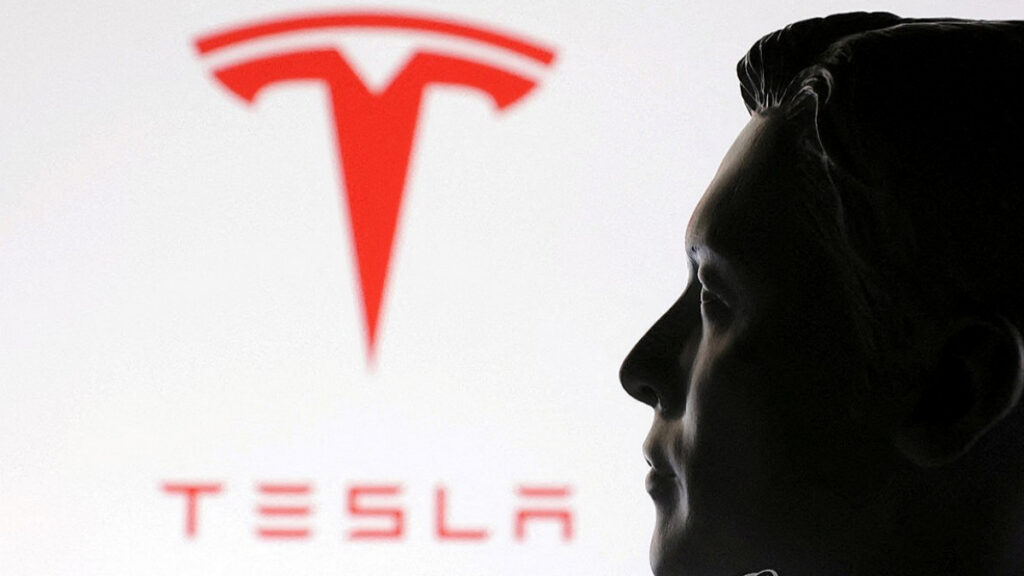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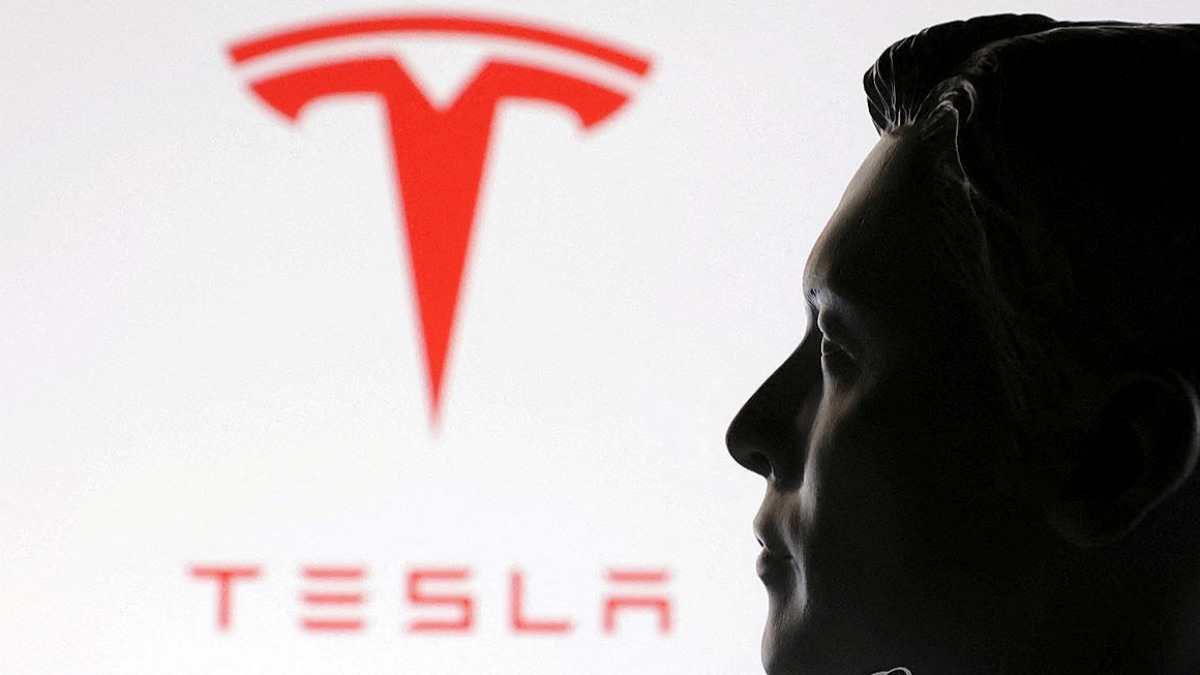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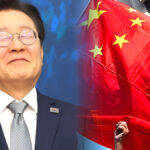
이것도기사냐 ?
제발 협력업체도 잘살수있게 부를
어느정도 분배새야만
같이 살아갈수있게 합시다
미국의 현지 생산하는 순간 망함. 왜 처음은 지들이 아쉬워서 제재 안 하지만, 나중엔 어떨지 뻔하잖아.
협력과하청 니들은 계속 손가락 빠는거 알지?
기술은 조심하고
제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지렛대가 되길 소망합니나
한번에 후~욱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잘 선택하시고 천천히 준비하고 진행하시길 기원합니다
굴종적 관계 협력은 미소뒤에 숨은 늑대에게 막힘는 닭과 같다
미국에 버리고올래?
무슨 미국 현지진출이냐? 한국을 미국의 전진기지요, 미군함 건조 및 수리를 위한 조선소로 재편하면 된다.
기술과 현지건조등을 어느정도 한다음 팽 당할까봐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