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웃는 사람 없다
알바 쪼개고 사장은 직접 일 나선다
“죽느냐 사느냐” 업종별 차등론 재점화

“이젠 정말 다 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4)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난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뒤로 매달 적자다.
아르바이트 학생 3명 중 1명을 이미 내보냈고, 나머지도 근무시간을 줄였다. “장사가 이렇게 안 될 줄 몰랐어요. 임금은 올리라고 하는데 손님은 안 늘어나니까요.”
소상공인 10명 중 7명, “내년엔 사람 덜 뽑겠다”
최근 발표된 전국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응답자 70%가 내년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직원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7만명이나 줄었다.
반대로 중견기업들은 오히려 직원을 늘렸다.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보면 더 심각하다. 작년 279만원에서 올해 208만원으로 71만원이나 줄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 한 달치와 거의 같다.
소상공인들이 꼽은 수익 감소 1순위 원인도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임대료나 재료비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다.
‘쪼개기 알바’라는 꼼수와 현실의 격차

궁지에 몰린 업주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쪼개기 알바’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하루 쉴 때 받는 추가 급여다.
예를 들어보자. 시급 1만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하루치 8시간분인 8만원을 더 줘야 한다.
하지만 같은 일을 주 14시간씩 두 명이 나눠 하면 주휴수당은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꼼수지만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숙박·음식업 근로자 3명 중 1명은 지금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
소규모 업장일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 반면 대기업에서는 이런 사례가 2%에 불과하다. 같은 룰이라도 체급이 다르면 느끼는 무게가 전혀 다르다.
경영계 “업종별로 다르게 하자” vs 노동계 “더 올려야 한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한다. 매출이 불안정하고 고정비가 많은 업종에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인상률 1.7%가 너무 낮다며 반발한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두고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희망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다.
최저임금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이 되려면, 그 위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의 현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하나의 숫자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현실 앞에서 더 정교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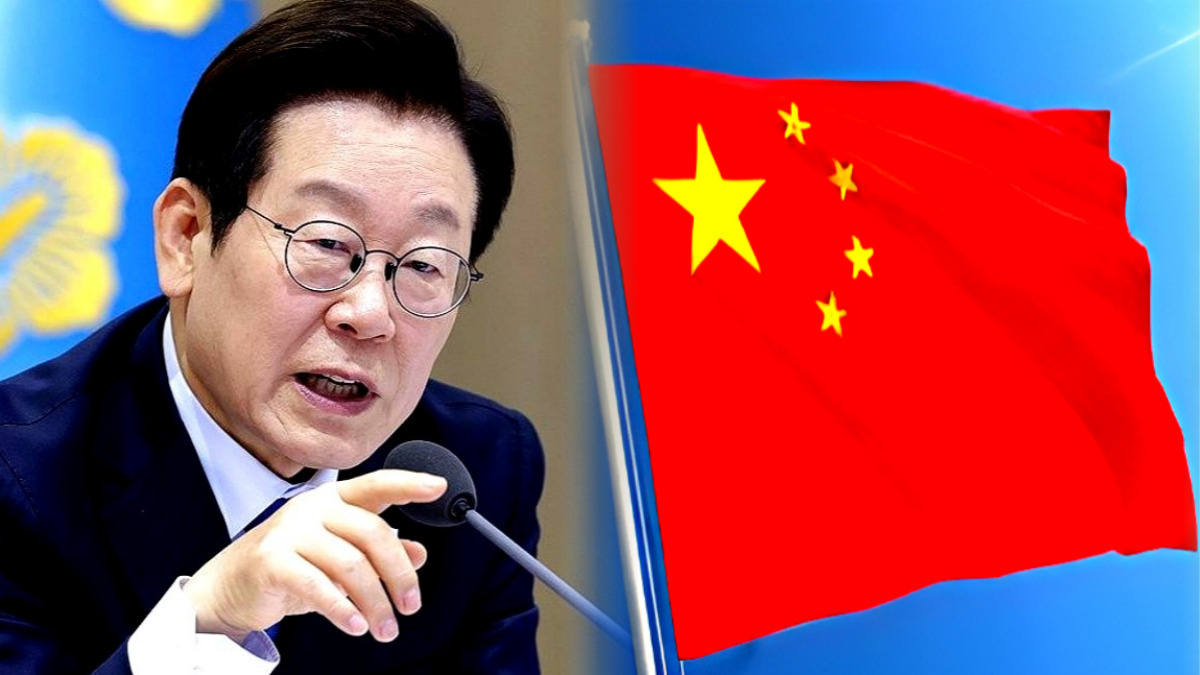














문죄인 동안 엄청 올려놓으니 악영향
정치인 사업자 모두가 난장판이다
시급 높다고 알바 자르고 장사 안되다 징징거리고…
돈이 있어야 너네 가게가서 밥이라도 사먹지.
돈이없어 난린데 너네가게 갈수 있을까?
왜? 지랄들이람? 너희 것들이 문어벙찍었잖아. 감수해야지.
임금이 오르니 당연히 물가가오르고 수요가없으니 소상공인 죽는걸 노동계에선 왜모르는가 귀족노조부터 해체가 답이다
경제를 말아먹은 윤건희,국짐해체가 답
최저임금만큼 일들은하면서 올려달라 하는거냐?
임금은자율에맡겨라
ㅋㅋㅋ 모든게 최저임금때문이냐
임대료는 깍았냐 세금은 깍았냐 물가도 깍아줬냐
기름값도 깍았냐 임금만 거의 안올랐다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 60시간 일하게 하는 업주 처벌 원합니다
성장 없는 명목임금 인상은 물가폭등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진다. 건전한 경제성장은 고용유연화, 기술 및 교육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키울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