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KAIST 최연소 석학, 정년 후 중국행
- 중국의 막대한 지원, 한국의 제도 부족
- 두뇌 유출, 국가 전략 자산 손실 우려
KAIST 최연소 석학이 정년 후 중국으로 향한 이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송익호 교수, 정년 후 중국 전자과학기술대학으로
- 중국의 막대한 지원, 한국 연구제도 빈틈
- 두뇌 유출로 과학 생태계 약화 우려
KAIST의 최연소 임용 석학이자 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 권위자인 송익호 교수가 정년 후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한국의 연구 지속 제도 부족과 중국의 적극적인 영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송익호 교수는 37년간 KAIST에서 연구와 교육에 헌신
- 정년 후 연구제도 미비로 중국의 미국 제재 대학으로 이동
- 중국은 막대한 지원과 자유로운 환경 제공
- 국내 석학 다수, 정년 후 연구 뒷받침 제도 부족으로 중국행
- 두뇌 유출이 국가 전략 자산 외부 유출로 확대
KAIST 최연소 석학, 정년 뒤 중국 제재대학행
중국은 막대한 지원, 한국은 연구제도 빈틈
두뇌 유출 심화…과학 생태계 약화 우려

KAIST에서 최연소 임용 기록을 세운 석학이 정년을 마치자마자 중국의 미국 제재 대상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이 길러낸 두뇌가 연구 무대를 해외로, 그것도 미중 갈등의 한복판인 중국으로 옮겼다는 사실은 과학계 안팎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KAIST 최연소 석학, 정년 뒤 중국행 택한 이유
🗳 의견을 들려주세요
한국 과학 석학들의 중국행, 방치해도 될까?
주인공은 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의 권위자인 송익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명예교수다. 그는 1988년 28세로 KAIST 교수가 되며 최연소 임용 기록을 세운 뒤 37년간 연구와 교육을 이어왔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그는 최근 중국 청두의 전자과학기술대 교수로 부임했다. 문제는 이 대학이 전자전 무기 기술 개발 등으로 미국 수출규제 명단에 오른 곳이라는 점이다.

송 교수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년 후 연구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KAIST도 정년 후 교수 제도를 운영하지만 일정 규모 연구비를 매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연구 지속의 장벽으로 지적된다.
💡 한국 석학들이 정년 후 중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한국 석학들이 정년 후 중국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는 연구 지속을 뒷받침할 국내 제도의 부재입니다.
- 한국의 연구제도는 정년 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 중국은 막대한 연구 지원과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 이에 따라 많은 석학들이 중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년 뒤 빈틈 방치…국가 전략 자산이 빠져나간다
사실 국내 석학들의 중국행은 이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성균관대 HCR 석좌교수, 김수봉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줄줄이 중국으로 향했다.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정년 뒤 연구를 뒷받침할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지원과 자유로운 환경을 내세우며 적극 영입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한림원의 조사에서도 회원 절반 이상이 최근 5년간 해외 영입 제안을 받았고, 그중 대부분은 중국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석학들이 더 많은 제안을 받았으며,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국내 연구 지속 제도의 미비가 가장 큰 이유였다.
두뇌 유출은 단순한 인재 이동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의 외부 유출로 번지고 있다.
석학들은 여전히 세계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활용할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은 자원과 기회를 내세워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과학기술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오랜 경험을 쌓은 석학은 연구 성과를 넘어 후학을 키우는 자산이다. 이들이 해외로 떠나는 흐름을 방치하면 연구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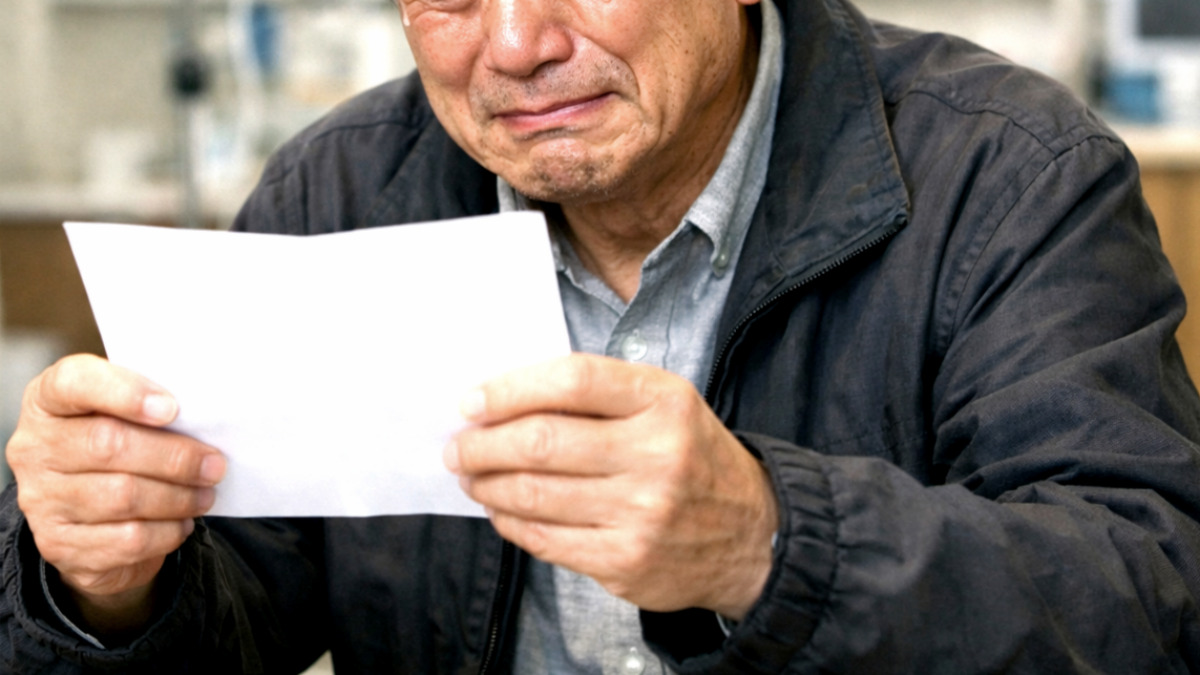











뒷받침이 안되면 얼마뒤엔 기술력에 서뒤쳐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