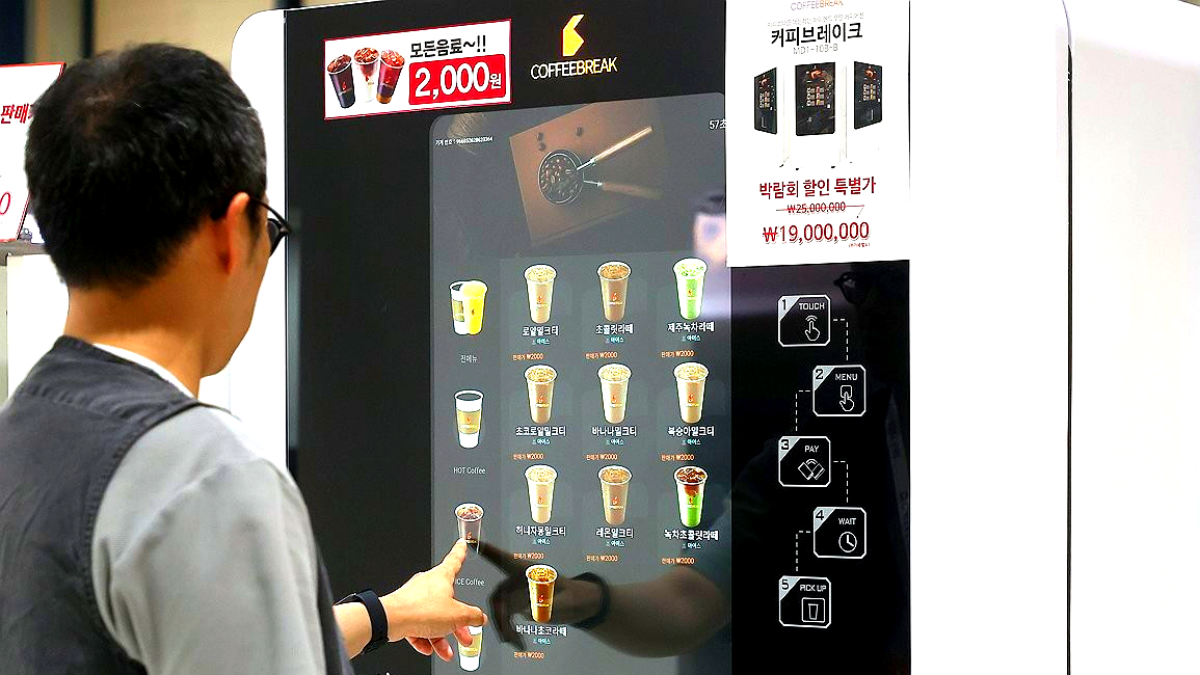노인 5명 중 1명 시대, 500조 치매머니 급증
선진국은 이미 자산 보호 제도 체계화
한국, 관리 체계 미비…속도전에 시계는 뒷걸음

대한민국이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어느새 길거리 다섯 사람 중 한 명은 노인이 됐고, 머지않아 세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상이 다가온다.
그 속도는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어떤 선진국보다도 훨씬 빠르다.
2018년 14%였던 고령 인구 비율은 단 7년 만인 2025년 20%를 돌파한다. 사회 시스템이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는 속도다.
폭주하는 ‘치매 머니’…500조 원 자산의 행방은?
이 폭발적인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 중이다.

바로 ‘치매 머니’라 불리는, 고령 환자들이 건강 문제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산이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기준 154조 원, 2050년에는 약 50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과 예금, 각종 금융자산이 모두 포함된 이 거대한 돈은 앞으로 누구의 손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런 고민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이미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은 각자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 왔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이 문제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판단력이 약해진 이들의 자산을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영국은 건강할 때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고 국가가 이를 감독하는 ‘LPA’ 제도를 운영하고, 미국은 사적 계약을 통한 위임과 신탁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런 시스템들은 금융 사기나 가족 간 분쟁을 막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본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속도전 벌어진 자산 관리…한국, 시간과의 싸움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 치매 머니는 쌓이고 있지만, 정작 그 자산을 지키는 제도는 아직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
성년후견 같은 제도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기만 하다. 최근 은행들이 유언대용신탁 등 치매 대비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부자들만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도 이제야 ‘공공신탁’ 도입을 논의하며, 민간 신탁 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해외는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준비해온 반면, 한국은 그 압축된 고령화 속도에 뒤따라가기도 벅차 보인다.
이미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는 동안 자산 관리의 사각지대는 넓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 충분할지, 더 큰 혼란이 닥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단순히 제도 마련을 넘어, 실질적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신속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