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퇴직 공직자들이 대기업으로 이동 중
- 삼성, 한화, 현대차가 주요 대상
- 전문성과 인맥을 활용한 영입
퇴직한 공직자들이 대기업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 한화, 삼성, 현대차가 주요 기업으로 꼽힙니다.
- 특히 국방부, 경찰청, 검찰청 출신들이 많습니다.
- 그들의 정책 이해력과 인맥이 기업에 큰 자산입니다.
- 고위직 출신의 연봉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몇 년간 퇴직 공직자들이 대기업에 대거 영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방, 법무, 금융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기업들은 이들의 인맥과 정책 이해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 한화는 국방부 출신, 삼성은 경찰청 출신, 현대차는 금융 관련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 대기업들은 이들의 경험을 통해 정부 사업을 따내고 규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퇴직 공직자들의 연봉은 대기업에서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
- 공직 경험이 민간 시장에서 큰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퇴직 공직자, 한화·삼성·현대차로 대거 이동
정책 감각과 인맥 앞세운 ‘전문가 영입 경쟁’
공직의 경험이 시장의 권력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직을 떠난 사람들의 두 번째 커리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한때 나라의 예산과 정책을 다루던 이들이 이제는 대기업의 회의실에서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다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방·경찰·검찰 출신까지, 권력의 경험이 민간 무대로 이동한다
한화, 삼성, 현대차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그들을 가장 많이 맞이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퇴직 공직자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 기업으로 향했고, 그중 상당수가 대기업 계열사였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퇴직 공직자의 대기업 행이 적절할까?
특히 국방부와 경찰청, 검찰청 출신이 많았다. 공공성과 민간 이익이 맞닿은 방산, 보안, 법무, 금융 분야가 이들의 주 무대다.

한화는 국방부 출신, 삼성은 경찰청 출신, 현대차는 국방·금융 관련 인재를 중심으로 영입했다. 얼핏 보면 ‘전문성의 연장선’ 같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맥락이 있다.

기업들이 이들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력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다.
💡 퇴직 공직자들이 대기업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 공직자들이 대기업으로 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들은 정부 정책과 규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은 정부 사업을 따내고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활용합니다.
- 대기업은 퇴직 공직자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공하며, 이는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길을 아는 사람’을 모셔오는 셈이다. 정부 사업을 따내거나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이들의 존재는 든든한 보험처럼 작용한다. 반면 밖에서는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일까”라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공직 떠나면 연봉 수억…‘황금 이력서’ 된 전직의 힘
보상 수준을 보면 민간 기업이 왜 이들을 반기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 법무나 대관, 컴플라이언스 부서로 이직한 전직 공무원의 연봉은 통상 1억 원을 웃돈다. 고위직 출신이 임원으로 직행하면 기본 급여만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사외이사로 일할 경우에도 1억 원 안팎의 보수를 받는다. 로펌으로 옮긴 경우에는 ‘전문위원’이나 ‘고문’ 형태로 연 8천만 원에서 2억 원 이상을 받는 사례가 많다. 결국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이 민간 시장에서 ‘희소 자산’처럼 거래되는 셈이다.

특히 규제가 복잡한 산업일수록 이런 인력의 몸값은 높아진다. 방산, 금융, 가상자산 업계가 대표적이다.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금감원 출신을 다수 채용했고, 방산기업은 국방부 출신 전문가를, 플랫폼 기업은 법조계 출신을 잇달아 영입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장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는 풍경이다.
모든 전직이 부정적으로만 보이진 않는다. 공직 경험을 민간에 전해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는 흐름은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과 정보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며, 전관예우와 로비 의혹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퇴직 공직자의 민간행은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경력 경로로 자리 잡았다. 국방과 법무, 금융을 넘어 더 넓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공직의 경험이 시장의 권력으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사회가 균형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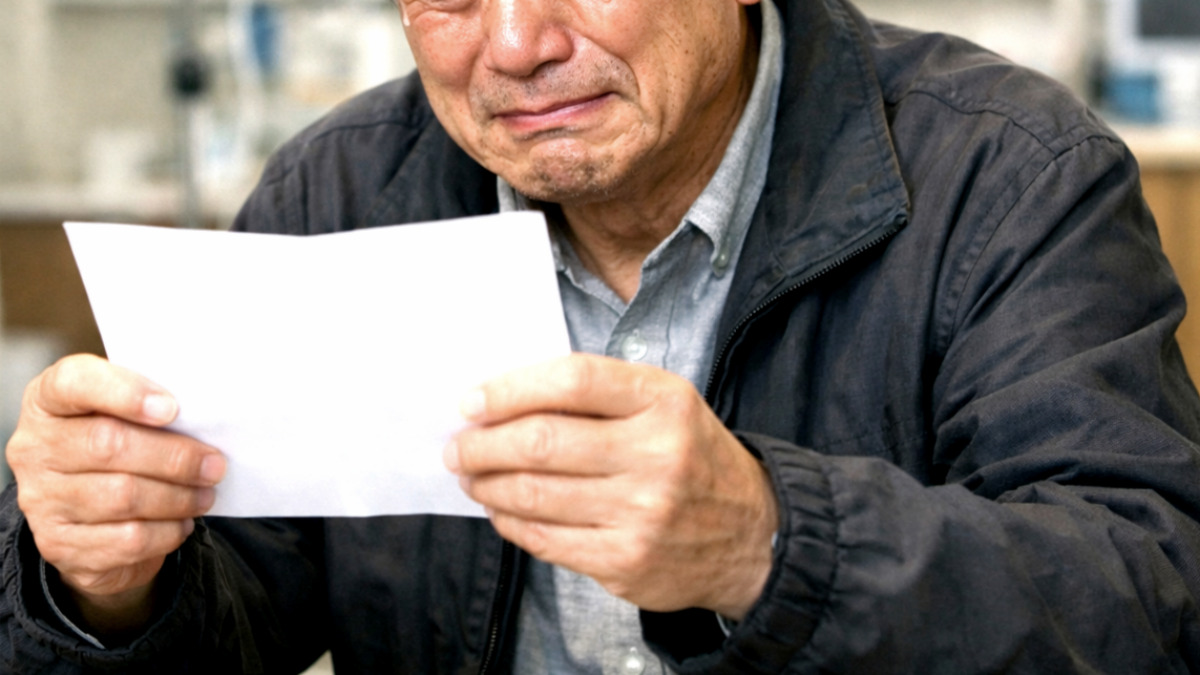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도를 만들고 보수도 한게를 두어통제 하며 위반시 모두 구카에 귀속토록 해야한다
전임자라는 공직 카르텔을 로비스트로 이용 못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60세 은퇴인데 연금은 65세부터 주고.. 기업에서 커리어 살려서 돈도 많이 주겠다는데 폐지주울거 아니면 당연히 가야지. 아님 퇴직금을 10억씩 주고 재취업을 막으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