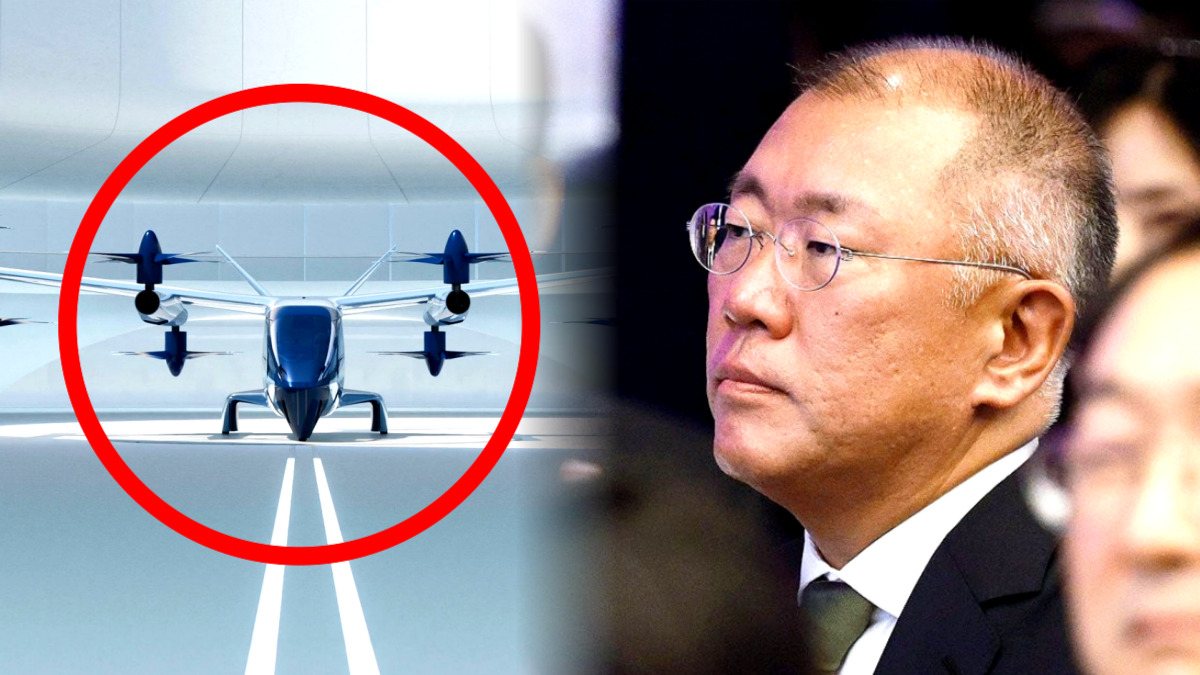테슬라 FSD, ‘완전 자율’ 표현 두고 허위 논란 재점화
운전자 보조 수준인데도 기대 키웠다는 지적 나와
웨이모와 대비된 접근, 한국 소비자도 고민 깊어져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FSD 마케팅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행정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능을 넘어, 기술을 어떤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FSD를 둘러싼 관심이 급격히 커진 상황이라 더 눈길을 끈다.
‘완전’이라는 단어의 무게…테슬라 FSD를 둘러싼 기대와 규제의 충돌
문제의 출발점은 이름이다. ‘Full Self-Driving’이라는 표현은 많은 소비자에게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달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준다.
판사는 바로 이 지점을 짚었다. 실제 테슬라의 FSD는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해야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가깝다.

기술적으로는 레벨 2, 일부 상황에서 레벨 3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름이 만들어내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행정 판단으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은 테슬라에 마케팅과 용어를 시정할 시간을 주면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 허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슬라는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규제 당국은 표현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명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논쟁은 확산됐다.
웨이모는 되고 테슬라는 왜 논란일까…자율주행을 대하는 두 개의 방식
같은 자율주행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도 대비된다. 구글 계열사 웨이모는 현대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 판매가 아닌, 제한된 환경에서 검증된 레벨 4 자율주행이다. 규제 당국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유다.
한국 시장은 이 흐름의 한가운데 있다. 테슬라는 모델 Y를 앞세워 국내 판매를 늘리고 있고, 일부 모델에서는 감독형 FSD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완전 자율’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언어와 제도는 여전히 조정 중이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지, 향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