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수한 미쓰비시, 현대·기아는 정면 돌파
수출기지·전용 전기차로 체질 개선 나섰다
브랜드 쇄신까지… 생존 전략 시험대에 올라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외산차의 무덤’이 된 중국에서, 완전 철수한 미쓰비시와 달리 생산기지 개편과 현지 맞춤형 전기차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때 도로를 장악했던 외국 브랜드들이 전기차 대전환 앞에 고전하는 사이, 미쓰비시는 50년 가까이 이어온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정리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똑같은 위기를 마주했지만, 방향을 바꿔 버티는 쪽을 택했다. 지금 중국 시장의 이 대조적인 장면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겪는 구조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수출기지로 변신한 중국 공장… “버릴 곳은 없다”는 생존 공식
현대차·기아의 2024년 중국 시장 합산 점유율은 1.6%. 과거 10%에 육박했던 전성기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그 사이 BYD, 지리(Geely) 같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빠른 전동화와 가격 경쟁력, 강한 내수 선호를 등에 업고 시장 점유율 65%를 넘기며 시장을 장악했다.
외국차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졌다. 현대차·기아도 한때 갈피를 못 잡았다. 전동화는 늦었고, 브랜드는 가성비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미쓰비시처럼 철수하진 않고, 자산을 재활용하는 실리 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첫 번째는 생산거점 재정비다.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떨어진 공장들은 일부 매각하고, 남은 곳은 수출 전진기지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현대차그룹은 중국 공장에서 11만 8천 대를 수출하며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린 실적을 거뒀다.

중국산 쏘나타 택시를 한국으로 역수입한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잉 설비를 수익 자산으로 바꾸는 생존 전략이다.
둘째는 전동화 전환의 본격화다. 기아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전기 SUV ‘EV5’로 7년 만에 현지 법인을 흑자로 돌려세웠다. 가격, 기능, 디자인 모두 중국 소비자에 맞춘 이 전략 모델은 브랜드 회복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올해 하반기, 중국 전용 전기차 ‘일렉시오(elexio)’ 출시를 예고하며 반격에 나선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2026년까지 총 5종의 친환경차로 현지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은 브랜드 이미지의 쇄신이다.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력 있는 브랜드로 다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다.

고성능 ‘N’ 브랜드를 중국에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자동차 매니아 층을 공략해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이다.
철수냐 생존 실험이냐… 현대차·기아의 ‘중국 재도전’은 계속된다
물론 이 전략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토종 브랜드로 넘어갔다.
하지만 사업을 접기보다,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남은 자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미쓰비시의 선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면 철수와 구조적 생존 실험이라는 대조적 선택지 앞에서, 현대차·기아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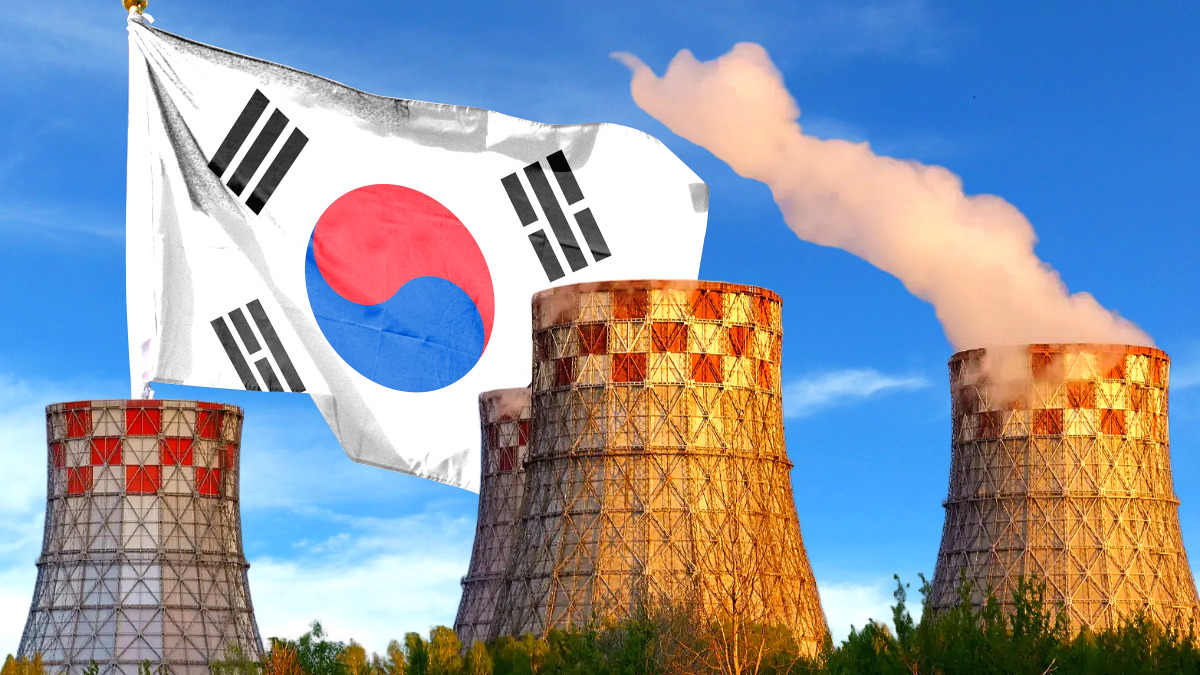


















중국산은 품질도 중국차다
싸게 조립해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고. 그래도 수입해라.
# /
연봉1억주어도 파업하는 현대차노조 배불리느니 차라리 중국공장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수입하고 그대신에 품질개선에 힘써라 ㆍ도요타수준으로 못하는거냐??안하는거냐??
제나라에서 버틸 힘도 의욕도 없다면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금속노조 피해서 가버리는게 답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