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에선 미래, 도로에선 불편…옵션 후회의 시작
터치 버튼·숨은 손잡이, 디자인이 사용성을 밀어냈다
출퇴근길에 안 쓰는 기능, 옵션 가치는 다시 묻고 있다

새 차를 계약하던 날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시장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던 최신 옵션들이 막상 일상 주행에 들어서면 기대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는 마음에 드는데 옵션은 후회된다”고 말하는 이유다. 자동차 기술은 분명 빠르게 진화했지만, 그 모든 변화가 운전자의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매끈한 디자인 뒤 불편한 진실, 문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
대표적인 사례가 터치식 공조기와 통합 디스플레이다. 물리 버튼을 없앤 실내는 한눈에 보기엔 미래적이다. 하지만 실제 주행 중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온도를 조금만 바꾸려 해도 화면을 여러 번 눌러야 하고, 그 사이 시선은 자연스럽게 도로를 벗어난다.
직관적인 조작 대신 익숙해질 때까지의 불편함이 쌓이면서, 과거의 다이얼이 그리워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화면 위에 남는 지문과 얼룩도 현실적인 불만으로 따라붙는다.

외관에서 호평을 받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도 비슷하다. 차체와 하나로 이어진 매끈한 디자인은 분명 눈길을 끈다. 그러나 처음 타는 사람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칫한다.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상황이 더 난감해진다. 눈이나 물기가 얼어붙어 손잡이가 나오지 않으면, 차 문을 열지 못한 채 서 있어야 하는 순간도 생긴다. 디자인을 위한 선택이 기본적인 사용성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셈이다.
“삐빅” 소리에 쌓이는 피로감, 안전을 위한 경고가 불안이 될 때
주차와 안전을 돕는 각종 센서 역시 기대와 다른 평가를 받는다. 위험을 미리 알려준다는 점은 반갑지만,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경고음은 오히려 긴장을 키운다.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반응에 피로를 느낀 운전자들이 기능을 꺼버리는 일도 적지 않다. 안전을 위해 달린 장치가 역설적으로 불안을 낳는 장면이다.

여기에 ISG 기능, 자동 주차, 파노라마 선루프, 제스처 컨트롤 같은 옵션도 비슷한 길을 걷는다. 연비를 위한 기능은 잦은 정차 구간에서 불쾌한 진동을 남기고, 자동 주차는 직접 하는 것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선루프는 개방감 대신 소음과 관리 부담을 안기고, 손짓으로 조작하는 기능은 오작동 끝에 꺼진다. 처음엔 첨단처럼 보였던 기술이 시간이 지나며 사용 빈도를 잃는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옵션 선택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무엇이 더 새롭고 화려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그리고 편안하게 쓰게 될지를 먼저 따져보려는 움직임이다.
자동차 옵션의 가치는 카탈로그 속 설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길에서 드러난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방향이 운전자의 실제 경험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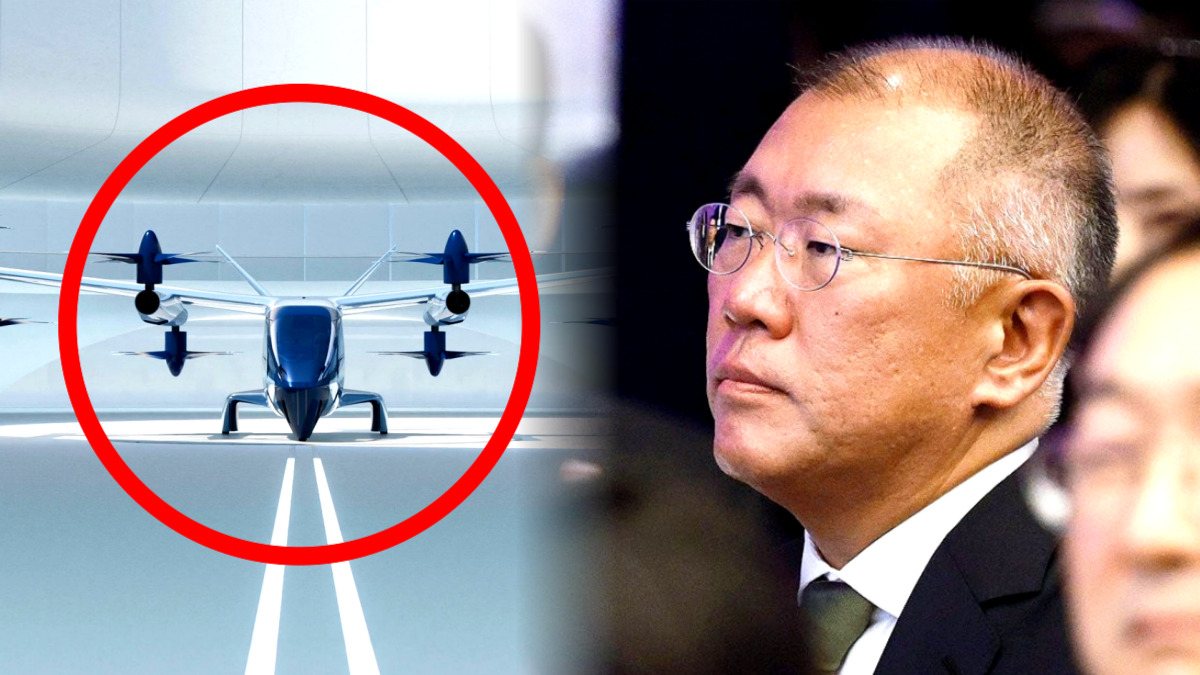


















○○차가 좋은 이유.
최첨단 사양이 없다.
– 배우려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
사골이 많다.
– 이미 굴리고 굴려 검증이 완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