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커덩 소리 없앤 혁신가
고속철도 꿈꾼 전 서울지방철도청장
한국 철도 근대화 선구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서울-부산간 2시간, 서울-목포간 1시간30분의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한다.”
1983년 한 철도청 관료가 퇴임사에서 남긴 이 말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권기안 전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있었다. 지난 17일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는 한국 철도 현대화의 숨은 주역이었다.
‘덜커덩’ 소리가 사라진 이유
1933년 충북 청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교통고등학교 토목과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교통부에 입부했다. 이후 1963년 철도청이 분리된 뒤로는 설계사무소장, 철도건설국장 등을 역임하며 1983년까지 한국 철도 현대화의 중심에 섰다.

1960년대 한국의 철도는 아직 원시적인 수준이었다. 나무 침목 위에 짧은 철레일을 이어 붙인 선로를 따라 기차가 달릴 때마다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익숙했던 이 소리는, 사실상 철도 기술이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그가 이끈 첫 번째 변화는 1962년, 콘크리트 침목의 도입이었다. 교통부 보선과 계획계에서 조사주임으로 근무하던 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관리했다.
마침 중앙산업이 독일 기술을 도입해 PS 콘크리트 침목을 시험 부설하고 있어 계획 수립은 비교적 원활했다. 이후 콘크리트 침목은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 철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이후 그는 두 번째 변화, 장대레일 도입에 나섰다. 짧은 레일을 이어 붙이는 기존 방식은 접합부마다 충격과 소음을 유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장대레일의 필요성을 담은 책자를 직접 제작해 배포하며 예산 확보에 힘썼고, 1967년 시흥~안양 구간 1,200미터에 국내 최초로 장대레일이 설치되었다.
선로의 연결 부위가 줄어들면서 소음과 진동은 현저히 감소했고, 더 빠르고 안전한 열차 운행이 가능해졌다.
소리 없는 선로 위, 고속철도의 씨앗

고인의 기술 혁신은 단지 소음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일찌감치 고속철도의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대레일을 도입하면 열차의 낭만적인 소리는 사라지지만, 선로 강도가 높아져 고속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1963년, 일본국철 초청으로 도쿄~오사카 간 시험 운행 중이던 신칸센에 탑승한 그는, 귀국 후 상세한 탑승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후에 발간한 『한국고속철도 20년사』는 이 보고서를 “우리에게 고속철도 기술을 소개한 결정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1970년대 말 철도청 설계사무소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영등포-수원 전철 복복선 논의 과정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구로 지역에서 분기해 안양 뒷산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대안 노선을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철도 근대화의 토대를 놓다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이용상 교수는 “1960년대 선로 보수의 근대화 방안으로 보선 작업 기계화를 최초로 도입했고, 장대레일과 콘크리트 침목 도입 등 철도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고인이 도입한 기술들은 현재 한국 고속철도의 핵심 기반이 되었다. 장대레일 없이는 고속철도의 안정적 고속 운행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콘크리트 침목 없이는 현재의 선로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선견지명과 기술적 혁신이 없었다면 한국이 고속철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철우회 등 코레일 퇴직자 모임이 27일 전한 그의 부고는 한국 철도사의 한 페이지가 마감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이기도 했다. 덜커덩 소리를 없앤 훌륭한 기술자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고인이 놓은 철로 위로 오늘도 열차는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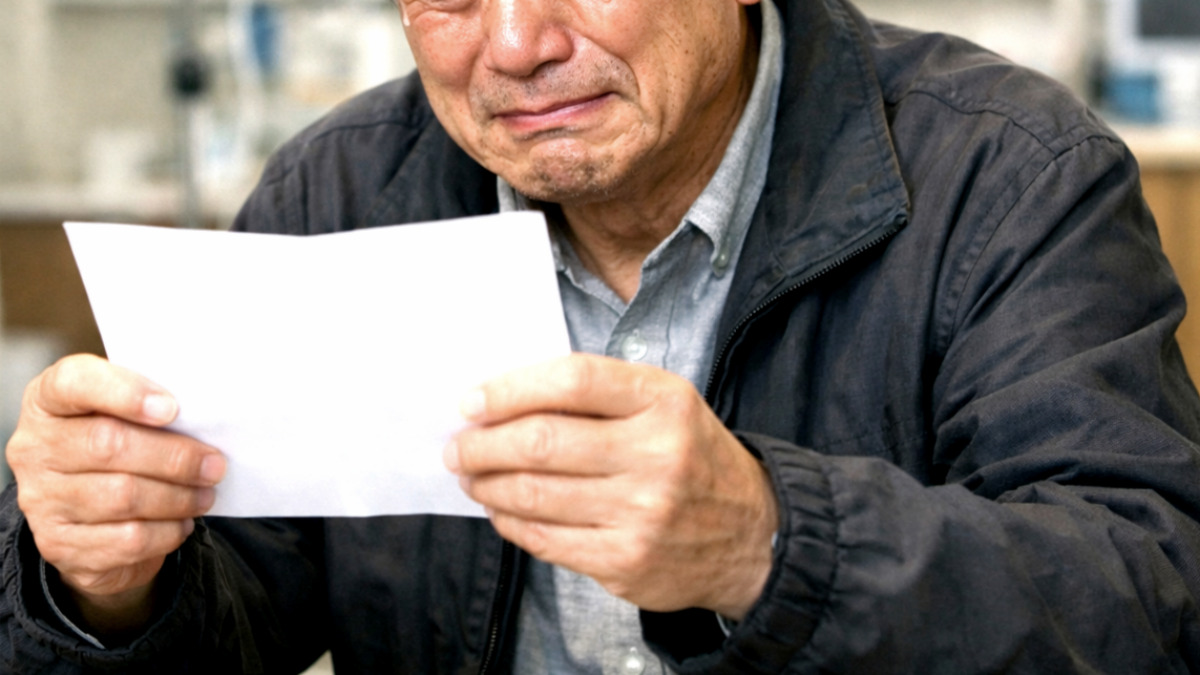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고속철도 수를 늘려야죠, 왜 줄이란건지….
안흥 해안포 사격장에서 포탄 발포시험중 폭사한 연구원틀의 희생정신 기사도 다뤄주세요~~
누군가의 희생없이는 이룰수없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시대를 이끌엇던 철도장인의 부고에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 국가 철도발전에 큰공로가 기차여행을
즐거움으로 만든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KTX는 차량구조 부터 문제라서
옆나라 신칸센 700가격 비슷하면서 좌석 더 구리고 탑승객은 더 적고 서울 부산 부분부분 고속화 안하고
대전 동대구 역만 들어가면 기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