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안 팔리면 소각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높아졌던 명품 산업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글로벌 명품 기업들인 LVMH(루이비통), 리치몬트, 그리고 구찌의 모기업 케링이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성장이 주춤하며 실적이 둔화됐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명품 열기가 식었다”는 의견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1인 당 명품 소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만큼 명품 열풍이 불기도 했지만, 백화점의 명품 판매 성장률이 0%로 사실상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명품 매출이 전체 중 약 30%를 차지하는 대형 백화점인 롯데, 신세계, 현대는 모두 2분기 영업이익이 20% 이상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제한 조치 기간 동안 억눌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끝난 것이며, 높은 가격과 제품 희소성 감소 등의 이유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떨어지는 명품 가치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에 따르면,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 LVMH의 미국 매출은 전년 대비 1% 감소하면서 주가도 4% 하락했다. 리치몬트는 미주 지역에서의 매출이 4% 감소하면서 주가가 10% 급락했고, 버버리와 케링은 미국에서 각각 8%, 23%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보복 소비가 끝나고 매출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제품의 희소성을 훼손한 것이 패착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의 포브스지는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고 제품을 대량 생산해 매출을 늘렸으나, 이는 명품의 희소성이라는 핵심 가치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명품의 60% 구매자는 초부유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소비자들이 명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 세계 두 번째로 큰 명품 시장의 침체도 명품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시장의 부진을 중국이 메울 것으로 기대됐으나, 중국의 경제 지표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명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싸게 파느니 태운다
명품 브랜드들은 ‘희소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시즌이 지나고 남은 재고는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많다.
명품 산업에서 희소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소비자들이 줄을 서 있는 오픈런’과 밤을 새워 제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뜻하는 ‘노숙런’이라는 말이 이를 방증한다.

명품의 가격이 비싸고 희소할수록, 사람들의 열망과 욕구는 증가한다. ‘재고 없음’이라는 표시는 소비자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는 신호로 작용하며, 이것이 백화점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이유이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재고가 남으면 극비리에 소각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샤넬은 물론,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같은 초고가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 라인은 이러한 처리에서 제외되곤 한다. 이 문제에 대해 ‘MBC뉴스’와 ‘세계일보’ 같은 언론 매체도 지적한 적이 있다.

이런 재고 소각은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품귀현상’을 만들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재고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브랜드 가치 유지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고 소각 후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면 세금 절약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반 패션 브랜드들도 종종 재고를 소각하고 있다.
재활용 방안 찾아야
패션 산업 안팎에서는 현재까지의 재고 처리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생산된 제품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환경에 해롭고, 현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나 중고 시장을 통한 유통, 또는 업사이클링 같은 대안적인 방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재고 처리 방식의 문제점은 단순히 환경 오염만이 아니다. 패션 아이템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다양한 원료와 공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된다.

예를 들어, 파타고니아는 자사의 재킷 하나 제작에 135리터의 물과 9kg의 탄소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60%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다. 따라서 일반 의류나 가방에서는 더 많은 환경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제품 소각을 금지하는 추세도 생기고 있다. 과거에는 효율성과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재고 처리 방법이 타당했을 수 있으나, 현재는 환경 친화적인 접근이 패션 산업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와 ‘효율성’이라는 패러다임 역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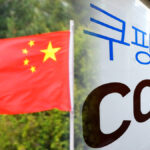

지구 환경 을 생각 하라
집단 이기주의 명품 기업들은
기자가 대가리가 없나 소비자가가 비싼거지 원가는 생각을 안하네 브랜드가치 때문에 세일 안하는거지
명품 구입
하지 말아야 할것같네유 남은물건 소각 뭍어 버린다니 아예 가격을 좀 낮추던지 맞음니다 브렌드 값
개나소나 다 갖고있는거 명품은 개뿔ㅋ
이산화탄소 증량이 프랑스 루..통 ,샤넬. 에.. 때문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