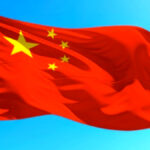일부 다주택자들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지방 아파트 중심으로 싹슬이 성행

“갭투자 하는게 뭐가 문제냐”
“전세 끼고 집 사는 건 수십 년 전부터 있어온 일인데 새삼스럽게 뭘 그러냐”
최근 지방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39) 김 모 씨는 지난달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A아파트 24평형(전용면적 59㎡)의 집주인이 되었다.
이 씨는 올해 초 매도인에게 일부 계약금을 내고, 1억 6000만 원의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렀다. 결과적으로 단 500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를 활용한 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천안시 서북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713건으로, 이 중 29.4%(210건)는 서울을 포함한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밝혔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36%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다수의 중개사무소가 갭투자 대상 매물을 소개하고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아파트 매수 시 프리미엄 없는 ‘무피’나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집을 구입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플러스피’ 매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등기비와 중개 수수료를 포함해도 몇백만 원이면 충분히 2~3채를 매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0~2021년 집값 급등기에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 방법으로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를 대량 매입했다.

또 다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문제는 갭투자를 부추긴 정부 정책 아니냐”며 갭투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의 취득세율이 12%에 이르는 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세율(1%)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규제 사각지대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갭투자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갭투자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매입자는 투자한 자금이 잠식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다”며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로 매입한 주택 중 약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갭투자는 세입자의 돈을 빌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일종의 기우제 투자”라며 “집값 상승기에는 수익이 나지만 침체기에는 낙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갭투자는 위기 시 매우 취약한 고위험 투자 방식”이라며 “남의 돈을 이용한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